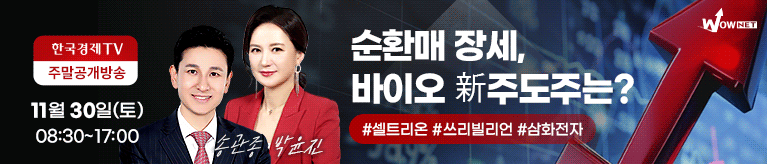석 달 전 ‘기술특례’로 상장한 뒤 승승장구하던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주가가 믿기 힘들 정도의 부진한 3분기 실적 공시로 나흘 만에 반토막 났다. 매출이 3억2000만원으로 97.6%(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고 영업적자도 8배인 344억원으로 불어난 점이 상장 후 첫 실적 공시에서 드러난 것이다. 팹리스 분야의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인 데다 메타와도 거래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기에 투자자의 실망과 충격이 만만찮다.
‘뻥튀기 상장 아니냐’는 의구심도 부풀 대로 부풀고 있다. 이번 공시로 2분기 실적도 매출 5900만원, 영업손실 152억원으로 구멍가게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난 7월 기업공개(IPO)를 위한 투자설명서에는 어닝 쇼크 가능성이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았다. 3월 10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 부진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와 상장 주관사의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불과 한두 달 뒤의 실적 추락을 모를 리 없고, 몰랐다면 ‘극심한 업무 해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금융당국도 IPO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심사 당시 제출한 실적 추정치가 적정했는지, 고의로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파두는 “예상을 뛰어넘는 업황 침체로 다른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4분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해명이다. 주가 폭락 직전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며 초기 기관투자가 일부가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 전에 규제 강화를 들먹이며 유망 스타트업 상장을 위축시키는 식의 성급한 대응은 경계 대상이다. 특히 파두의 상장 경로인 기술특례제도에 대한 과도한 매도도 금물이다. 기술특례는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 후 여러 긍정적 효과를 냈다. 올 들어서도 32개사가 기술특례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해 미래를 준비 중이다.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지만 4차 산업혁명의 선봉대인 만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특례 상장은 그 주요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초격차기술특례 신설, 신속심사제도 적용 확대, 주관사 책임성 제고 등 특례상장 활성화 조치를 약속대로 연내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기술특례 기업의 리스크를 인식하고 책임 투자를 더 강화하는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