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는 에너지 분야 소식을 국가안보적 측면과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룹니다.
심상찮은 해상풍력 발전업계-中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자사를 비롯해 해상풍력 업계 전반이 처한 상황을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다.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프로젝트 비용 급등…"모든 게 돈이다"
풍력 산업은 대형 터빈 구조물들을 수십 개씩, 대규모 단지로 세워야 발전량에서 경제성이 확보된다. 발전단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판매하려면 그리드(전력망)와 연결하는 작업도 추가돼야 한다. 최근엔 전기 생산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전해 설비(P2X·전기를 수소로 전환)를 함께 세우는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해상풍력의 경우 구조물 운반·설치용 선박과 해상변전소, 해저케이블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 수주에서 완공까지는 통상 5~7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특히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 등은 이들이 나중에 생산할 전기를 '일정 가격'에 '장기간' 구매하는 계약(off-take)을 미리 맺어둔다. 개발사의 장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명목에서다.

이 같은 사업 구조는 지난해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각국의 해상풍력 설치 수요는 급증했지만,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병목이 심각해지면서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발목을 잡고 있다. 터빈(블레이드)·타워·하부구조물 등 부품값뿐만 아니라 선박 가격, 공사비, 인건비까지 모두 뛰었다. 철판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50% 더 비싸졌다. 스웨덴 바텐폴은 올해 7월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이유로 "사업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급등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들의 긴축(금리 인상)도 해상풍력 업계에 타격을 입혔다.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만큼 고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스테드는 "40억달러(약 5조원)에 이른 미국 프로젝트 손상차손액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자금 조달 비용 급등 탓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발전 효율 때문에 70층 건물 크기만 해진 풍력타워…"누구를 탓하리오"
사업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한 원인은 업계 내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발전단지 개발 입찰에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성 악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여기에다 개발사들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터빈(블레이드) 확대 경쟁도 벌이고 있다. 터빈의 길이가 더 길수록 한번 회전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스코틀랜드 기업 SSE가 만든 최신 블레이드의 직경은 107m로 축구장보다 길어졌다. 터빈에서부터 타워를 포함한 전체 구조물의 크기는 뉴욕 록펠러센터 높이(약 260m)에 맞먹을 만큼 커졌다. 너무 크고 무거워진 최신 터빈은 또 다른 비용 급등, 공급망 병목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상으로 옮겨 설치할 선박의 크기도 개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개발사들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며 터빈 제조업체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의 최고경영자(CEO)가 "수십 년 동안 기술력을 끌어올렸는데, 손해를 입으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을 뿐이다. 결국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으려면 '터빈 크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 다른 공급망 이슈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클린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했다. 미국 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수소 에너지 설비 등을 지으면 총합 3690억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IRA 발표 직후 해상풍력 업계에도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랐지만, 세부 지침을 따져보면 IRA의 약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이 없는데, 미국산 써야 한다?"…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IRA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30%의 기본 ITC(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추가 조건들에 따라 최대 50%까지 이 혜택을 확대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올해 5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은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더 엄격해졌다. 이른바 '국내 컨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 때문이다. 이 로컬 조항은 미국산 부품 및 장비 등을 일정 비중 이상 사용해야 추가 10%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업계는 로컬 조항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공급망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재무부가 해상풍력의 경우 미국산 비중을 20%만 채워도 되도록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미국산 비중 40%)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했지만, "더 느슨해져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다.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해상풍력 관련 부품은 사실상 미국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테드가 미국 프로젝트에서 40억달러 규모의 손상차손을 보고한 배경으로도 이 로컬 조항을 꼽았다. 오스테드는 "미국산 공급망은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다른 추가 10% 혜택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부지 조건을 엮어놨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 화석연료 발전 지역 혹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발전 설비를 지어야 추가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풍속이나 항만 인프라, 육상변전소 입지 등을 따져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해 지역 조항을 따를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IRA를 통해 '친환경 전환'이라는 명분 외에 '제조업 부흥·고용 창출' 구상까지 한번에 실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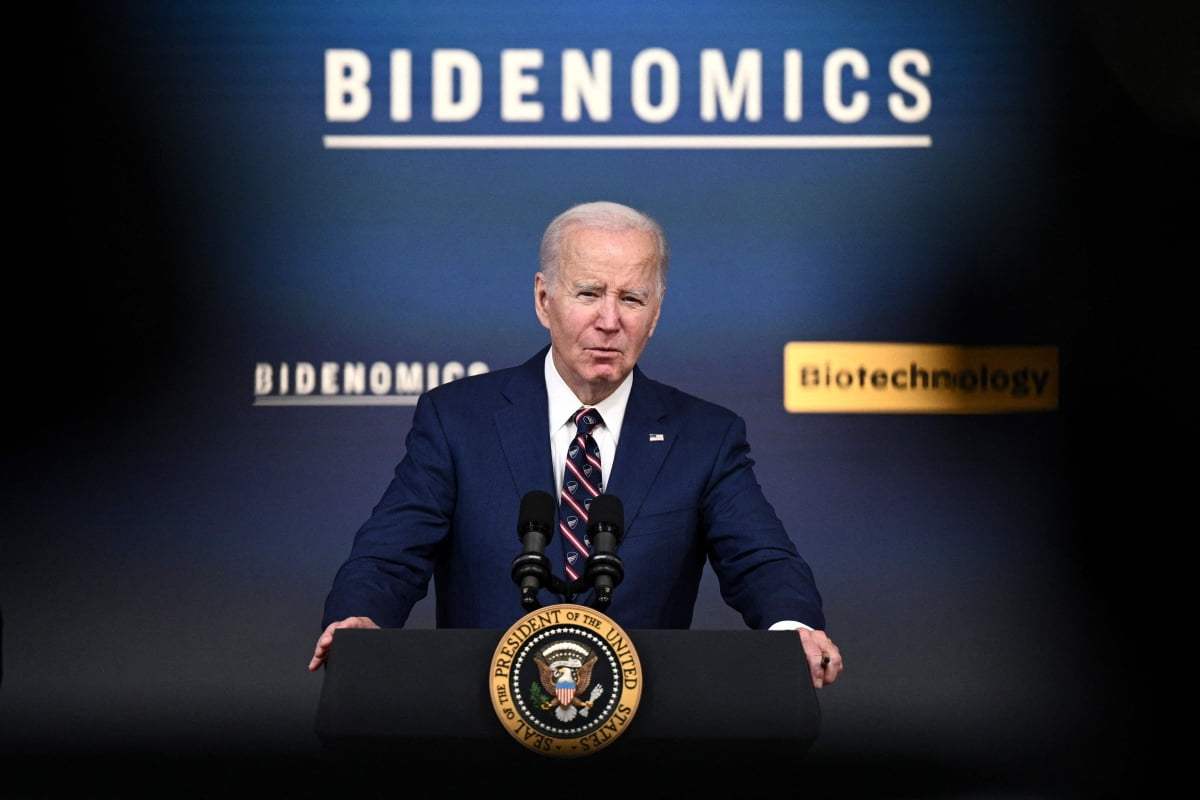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