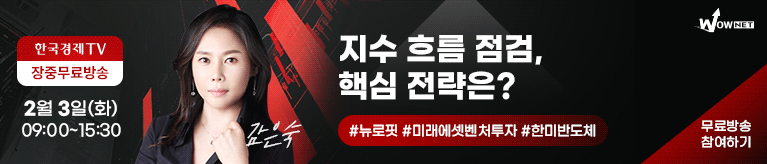“‘10월 영국 런던’을 제대로 즐기려면 6~7월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간 괜찮은 호텔과 식당은 모조리 예약이 끝나거든요.”
11일(현지시간) 런던 북부에 있는 리젠트파크. 이곳에서 만난 이탈리아 컬렉터 프란체스카는 휴대폰에 있는 캘린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 말 그대로였다. 해머스미스, 패딩턴, 킹스크로스 등 5성급 호텔들은 몇 주 전에 예약이 찼다. 일반 객실 하루 숙박료가 100만원을 넘는 등 평소보다 두 배가량 올랐는데도 ‘완판’됐다.
이유는 하나. 매년 이맘때 열리는 세계적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프리즈 런던’ 때문이다. 11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행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주목받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미국 뉴욕시장, 스위스 유명 컬렉터인 울리 지그, 할리우드 스타 에밀리 블런트 등이 이날 리젠트파크로 모인 이유다.
○20주년 프리즈, 첫날부터 ‘대박’

프리즈는 ‘젊고 신선한 아트페어를 만들자’는 취지로 영국 미술 평론가 어맨다 샤프와 매슈 슬로토버가 2003년 시작했다. 돈이 없다 보니 첫 전시무대는 공원에 친 천막이었다. 이게 프리즈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됐다. 이제 9만 명(작년 기준) 넘는 관람객이 찾는 글로벌 행사가 됐는데도 ‘천막 부스’는 그대로다.
올해도 거대한 천막에는 40개국, 166개 갤러리 부스가 들어섰다. 천막 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컬렉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데미안 허스트의 ‘프리즈 20주년’ 기념 신작으로 채워진 가고시안 부스는 인증샷을 찍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미술시장의 열기가 작년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느낀 ‘체감 인기’는 호황 때와 비슷했다. 프리즈가 초청한 VIP로 입장객을 제한했는데도 공원 앞에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프리즈 런던 관계자는 “기업 회장, 컬렉터 등 한국에서 온 VIP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첫날부터 수십억원대 작품이 줄줄이 팔렸다. 하우저앤워스는 프랑스 조각 거장인 루이즈 부르주아의 300만달러(약 40억원)짜리 조각을 포함해 여러 점을 팔았다. 페이스갤러리가 공원 야외에 전시한 루이스 네벨슨의 조각은 200만달러(약 27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오픈 직후 바로 팔려나갔다. 국제갤러리가 가져온 박서보의 ‘묘법’은 43만~51만6000달러(약 5억7000만~7억원)에, 갤러리현대 부스에 걸린 신성희의 그림은 15만달러(약 2억원)에 팔렸다.
○‘미술 맹주’ 놓고 런던·파리 진검승부
잘 키운 아트페어는 지역 경제, 더 나아가 나라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 그림을 사기 위해 들른 ‘큰손’과 갤러리 관계자들이 1주일가량 머물면서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국제컨벤션협회에 따르면 아트페어 등 마이스(MICE) 행사 참석자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약 53% 더 많이 소비한다. 영국 지역지 이브닝스탠더드는 “지난 20년간 프리즈를 통해 런던은 외국 갤러리 유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봤다”며 “올해도 프리즈를 찾은 관광객이 쓴 수백만파운드가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프랑스 파리가 런던에 맞서 ‘아트페어 전쟁’에 뛰어든 건 이런 이유에서다. 파리는 프리즈 런던이 끝나는 바로 다음주(오는 18~22일)에 ‘파리 플러스’를 연다. 지난해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파리 플러스는 프리즈의 라이벌인 아트바젤이 파리의 토종 아트페어 피악을 인수하며 새로 출범한 아트페어다. 파리시와 아트바젤은 이 행사를 앞세워 파리를 ‘세계 최고 아트페어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프리즈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외신 인터뷰에서 “파리에 맞서 영국을 세계 예술의 최전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런던=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