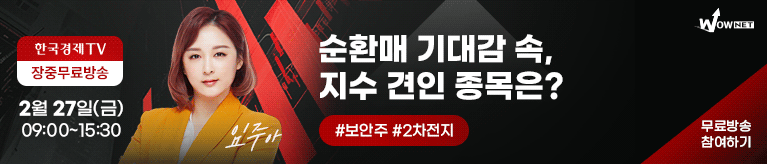글로벌 명품·패션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 시장 직접 진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 패션 업체들과 독점 판권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우회 진출을 택했던 유수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법인을 세우고 제품 소싱(조달), 홍보, 판매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후 3년여간 한국 직접 진출을 실행했거나, 선언한 해외 브랜드만 30여 개에 달한다. 패션업계에선 “한국 패션 산업사(史)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1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스웨덴 의류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는 최근 한국 시장 직진출을 결정했다. ‘MZ세대 신(新)명품’으로 꼽히는 아크네는 2013년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을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 왔다. 이달부터는 신세계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아크네 국내 매장 운영 등 ‘서비스 매니지먼트’만 맡게 된다.
지난해 명품 의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등을 소유한 OTB그룹에 이어 올해는 ‘끌로에’(리치몬트그룹) ‘셀린느’(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 등도 줄줄이 별도 법인을 세우고 한국 시장에 직진출했다.
최근 3년간 국내에 직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을 밝힌 해외 브랜드만 30여 개에 달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론 국내 명품 시장이 급성장한 데다 수년간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해 인지도도 쌓은 만큼 직진출을 통해 이익을 늘리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론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열풍이 거세게 부는 걸 활용해 한국에서 먼저 성공한 뒤 이 성과를 내세워 해외 판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루이비통’ ‘구찌’ 등 명실상부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이 잇달아 국내에서 패션쇼를 연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간호섭 전 한국패션문화협회장은 “K컬처의 확산 덕에 한국이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아시아 패션 시장의 테스트 베드(시험 공간)로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시장의 테스트베드”…직진출 실패 위험에도 명품 기업들 줄섰다
미국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이 지난 19일 서울 도산대로에 연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에 20·30대 ‘패피’(패션 피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스트리트 패션계의 샤넬’이라고도 불리는 슈프림 제품은 그간 해외 직구(직접 구매)나 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희귀템’(희귀 아이템)이었다.슈프림은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매장 확장에 신중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슈프림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한국을 일곱 번째 직접 진출 시장으로 택하자 패션업계에선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명품社 직진출 러시
글로벌 명품·패션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직진출이 줄을 잇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무렵부터다. 국내 수입 의류·명품 시장은 코로나에 따른 소비 침체에도 최근 수년간 팽창을 거듭했다.글로벌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141억6500만달러(약 18조7000억원)로 전년보다 4.6% 성장했다. 1인당 연간 명품 소비액(325달러·모건스탠리 추정)은 미국,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20년 ‘몽클레르’에 이어 지난해 ‘메종 마르지엘라’ ‘질샌더’ ‘디젤’ 등을 보유한 OTB그룹, ‘끌로에’ ‘셀린느’ ‘톰 브라운’ 등이 직진출에 나섰다.
한국 직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개선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패션업체와 독점 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 돈은 국내 업체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지만, 현지 법인을 세우고 매장 운영 등 단순 리테일(소매) 매니지먼트만 맡기면 본사 매출에 합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랄프로렌’ ‘푸마’ 등이 국내 판권 계약을 깨고 직진출로 선회한 것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유리
최근에는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영향력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패션업계의 진단이다. K컬처의 파급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 한국에서의 성공이 실적이 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은 물론, 북미·유럽 등 기존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한류 스타나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요즘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와 축구 선수 손흥민을 비롯해 한국 스타들을 글로벌 앰배서더(홍보대사)로 쓰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한류 스타를 글로벌 앰배서더로 기용하는 것은 K컬처가 그만큼 트렌디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 창출 효과 커
업계에서는 글로벌 명품·패션 기업들의 직진출이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지 수십 년이 된 명품 브랜드의 선례가 이를 입증한다.이들 업체는 2020년부터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적지 않은 이익과 배당을 챙겼지만, 고용 창출, 법인세 납부 등을 통한 기여도도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1년 국내 법인을 세운 ‘샤넬’은 작년 말 기준으로 1574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 매출이 1조6000억원대로 비슷한 한 식품업체 임직원 수가 1100명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지난해 1조6900억원가량의 매출을 낸 루이비통코리아도 1092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이들 업체가 내는 법인세 역시 상당하다. 샤넬코리아와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각각 1058억원, 38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세계 최고 패션 하우스들이 국내로 몰려들면 ‘한국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사랑하는 나라’란 인식이 확산하고, 그 영향으로 K컬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