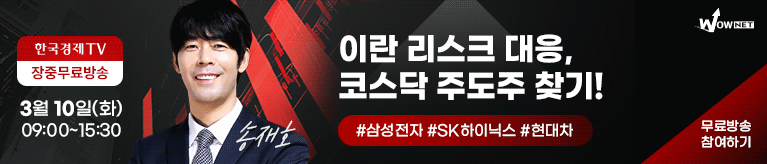독일은 1939년 9월 16일 원자폭탄 개발에 나섰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약 2주가 지난 때였다. 독일 군부는 비밀리에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을 수도 베를린에 불러 모았다. 병역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대신 핵분열 폭탄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우라늄 클럽’으로 불린 과학자 모임엔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 연구로 유명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참여했다.
독일의 핵무기 개발 소식을 전해 들은 연합군은 발칵 뒤집어졌다. 미국은 부랴부랴 맨해튼 계획을 꾸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독일의 원자탄 개발을 저지해야 했다. 한편으론 연합군이 독일의 핵 개발 계획을 눈치챘다는 걸 숨겨야 했다.
 <원자 스파이>는 나치의 원자폭탄 개발과 이를 막으려는 연합군의 실화를 다룬 책이다. 600쪽이 넘는 꽤 두꺼운 책이지만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덕에 페이지가 잘 넘어간다. 핵분열에 관한 과학 지식을 쉽게 습득하는 건 덤이다. 저자 샘 킨은 미국의 과학 분야 논픽션 작가다.
<원자 스파이>는 나치의 원자폭탄 개발과 이를 막으려는 연합군의 실화를 다룬 책이다. 600쪽이 넘는 꽤 두꺼운 책이지만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덕에 페이지가 잘 넘어간다. 핵분열에 관한 과학 지식을 쉽게 습득하는 건 덤이다. 저자 샘 킨은 미국의 과학 분야 논픽션 작가다.물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해 만들어진다. ‘경수’라고 한다. ‘중수’도 있다. 보통의 수소 원자와 달리 중성자가 하나 달린 무거운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결합한 물이다. 중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데, 핵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중성자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라늄 등 핵연료를 그대로 지나친다. 하지만 중수 등 감속재로 속도를 늦추면 우라늄이 중성자 에너지를 흡수해 핵분열을 일으킨다.
1940년 1월 독일은 중수 확보에 전력을 쏟는다. 연합군은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했다. 당시 중수를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단 한 곳이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160여㎞ 떨어진 황량한 고원에 있는 베모르크 수력발전소였다. 3월 프랑스가 가까스로 베모르크에 있는 중수를 모조리 빼돌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하며 베모르크 발전소는 나치의 손에 들어간다.
수많은 인물이 이 첩보전에 등장한다. 그중에는 메이저리그 야구 포수 출신에서 스파이로 변신한 모 버그도 있고, 훗날 대통령이 된 동생 존 F 케네디보다 나은 전공을 세우려고 애쓴 조 케네디 주니어도 있다. 닐스 보어, 로버트 오펜하이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졸리오·퀴리 부부 등의 과학자도 주요 등장인물이다. 미국은 독일 핵 개발의 핵심인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하려고도 했다.

저자는 방대한 사료와 연구를 토대로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의 좌충우돌을 유머러스한 문체로 생생하게 되살린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 개봉을 앞두고 최근 원자폭탄과 관련한 책이 많이 출간됐다. 한국어로 처음 번역된 <하나의 세계, 아니면 멸망>은 1946년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보어 등 당대 유명 과학자들이 함께 쓴 책이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몇 달 후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맨해튼 프로젝트 주역들은 인류가 불현듯 손에 쥐게 된 이 막대한 힘의 바탕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으며, 그 힘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대중의 언어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국가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반대의 길을 택한다면 세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영화 개봉에 맞춰 재출간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오펜하이머 평전이다. 어린 시절부터 맨해튼 프로젝트 총지휘자로서의 활약상, 매카시즘에 휘말려 수모를 겪고 물러난 말년까지의 이야기가 1000쪽이 넘는 두꺼운 책 속에 상세히 담겼다. 미국에서 2005년 출간된 이 책은 퓰리처상 전기·자서전 부문을 받았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