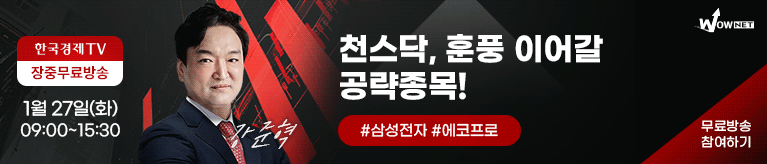최근 국내 출간된 아일랜드 소설가 윌리엄 트레버(사진)의 유작 소설집 <마지막 이야기들>은 반대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드러난다.
최근 국내 출간된 아일랜드 소설가 윌리엄 트레버(사진)의 유작 소설집 <마지막 이야기들>은 반대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드러난다.2016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트레버는 살아 있을 때 현존하는 영어권 작가 중 단편소설을 가장 잘 쓴다는 평을 들었다.
소소한 삶을 정밀하고 절제된 문장으로 그리는 솜씨는 100여 년 전 살았던 안톤 체호프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18편의 장편소설과 수백 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영국·아일랜드 작가에게 주는 문학상인 휫브레드상(현 코스타상)을 세 번 받았다. 부커상 후보엔 다섯 번 올랐다.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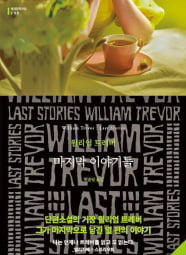 트레버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인 2018년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마지막 이야기들>은 그가 말년에 쓴 열 편의 단편을 담았다. 여러 인물이 겪는 고독과 상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트레버가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인 2018년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출간된 <마지막 이야기들>은 그가 말년에 쓴 열 편의 단편을 담았다. 여러 인물이 겪는 고독과 상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피아노 선생님의 제자’는 천재 소년을 제자로 받아들인 피아노 선생님 이야기다. 소년이 레슨을 다녀가면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 9쪽에 불과한 짧은 소설이지만 그 안엔 주인공의 인생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가 담겨 있다. 트레버는 설명을 줄줄이 늘어놓지 않는다. 간결한 문장으로 독자가 짐작하게 할 뿐이다.
‘다리아 카페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절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사랑과 우정을 한꺼번에 잃은 여성이 등장한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와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데 담담하기만 하다. 이미 시간이 한참 흘렀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책에 실린 단편은 각 20쪽 내외로 누구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완성도는 대단히 높다. 트레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썼는데, 다 쓴 뒤에는 불필요한 문장과 단어, 반복된 서술을 마구 쳐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짧지만 명료한 글이다. 산뜻하지만 묵직하다. 그래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평했다.
“이 아일랜드 거장의 글은 물처럼 맑지만 진과 같은 맛이 난다(The Irish master’s prose is as clear as water, yet tastes like gin).”
누구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평소 소설을 잘 읽지 않는 사람도 도전해볼 만하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