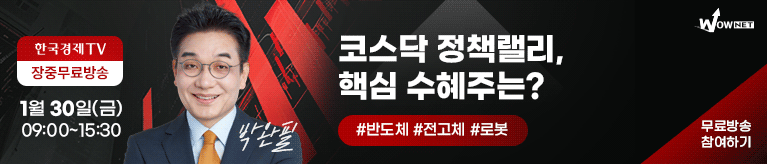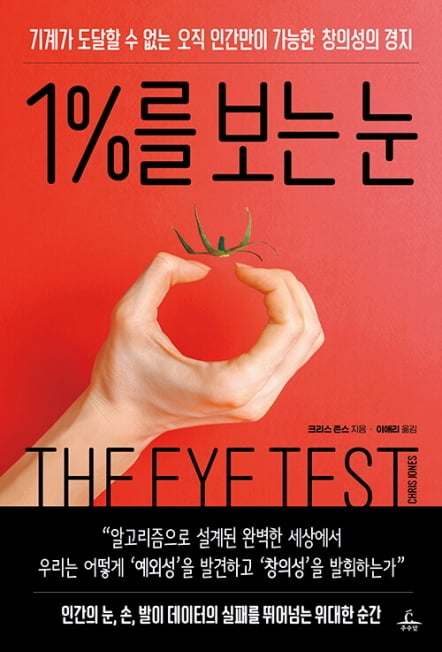
여기 데이터를 맹신한 사람이 있다. 2009년 미국의 영화 제작사 릴레이티비티의 라이언 카바노 최고경영자(CEO)는 ‘대박 영화’의 비밀을 풀었다고 자신했다. 영화 제작에 애널리틱스(통계적 분석)를 도입한 것. 그는 과거에 어떤 작품이 어디서 흥행했는지, 심지어 어느 계절에 인기가 있었는지까지 숫자로 분석했다.
결과는 대실패. 제작비 4200만 달러를 들인 ‘워리어스 웨이’(2010)는 57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쪽박’ 행진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결국 2016년 릴레이티비티는 파산을 선언했다. 분명 통계와 알고리즘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다.”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1%를 보는 눈>은 기계적 접근이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말한다. 최첨단 알고리즘을 동원해도 인간의 변덕스러운 욕망은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릴레이티비티의 사례도 예전에 나온 콘텐츠에 쉽게 질리는 인간의 창의적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잡지 ‘에스콰이어’의 수석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존스다. 그는 엔터테인먼트부터 날씨, 정치, 경제, 의학 등 일상 영역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데이터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종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 마술사 텔러 등 그가 직접 취재하며 만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미국식 유머와 함께 풀어낸다.
흥미를 끄는 사례들과 별개로, 책의 논의 자체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다룬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AI는 객관적인 정보처리 능력에서 인간을 앞설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기계의 작동을 감수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취향이나 열정, 호기심, 독창성 등의 덕목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 등의 주장은 자못 익숙하게 느껴진다.
영문 원제 ‘더 아이 테스트(The Eye Test)’보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이 주제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AI를 비롯한 기계가 현대사회의 99%를 차지할 날이 머지않은 지금. 저자는 나머지 1%에서 인간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이 모든 재미없는 기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넓히려 노력해야 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