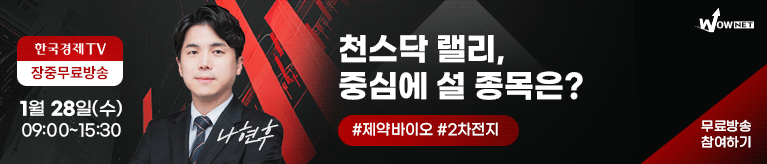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미국 금융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들이 한국 저자가 쓴 책에 모두 추천사를 써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출간된 <주식투자, 강환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에는 이들의 이름을 단 추천사가 일제히 실렸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세 사람의 문체를 모방해 만든 가짜 추천사다. 챗GPT가 투자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출판사의 설명이지만, 대가들의 이름에 혹해 책을 산 독자들은 “선을 넘었다”며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독자가 책을 고를 때 추천사를 얼마나 의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추천사는 책에 붙는 품질 보증서나 마찬가지다. 책 띠지에 ‘OOO 강력 추천’이라고 유명인 이름 석 자를 넣기 위해 출판사 편집자는 섭외에 공을 들인다. 챗GPT를 동원해서라도. 일부 출판사에서는 “추천사 내용은 편집자가 다 알아서 쓸 테니 이름만 빌려달라”고 할 정도다. 책의 품격을 높여줄 추천사를 받기 위해 몇 개월 혹은 1년씩 원고를 묵히는 일도 벌어진다.
추천사가 책 판매에 정확히 얼마큼 도움을 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출판사는 독자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끌기 위해 추천사 섭외에 열을 올린다. 유명인의 말 한마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새는 유튜브 영상 속 책 추천이나 소셜미디어에 나온 글들이 일종의 띠지다.
1인 출판사인 곰출판이 2021년 출간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 룰루 밀러는 국내 처음 소개된 작가다. 에세이와 학술서를 넘나드는 독특한 서술 방식이 책의 매력이지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책 분야 유명 유튜버인 김겨울이 대가 없이 이 책을 추천한 후 화제작으로 떠올랐고 현재까지 2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출간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서점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경보 곰출판 대표는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김겨울 씨가 책을 소개해준 뒤 판매량이 수직 상승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추천사에도 원고료가 있을까. 정답은 ‘사람 따라 다르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공짜로 추천사를 써주지만, 대체로 20만~50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 책에 들어가는 추천사가 통상 200자 원고지 2~3장 분량인 걸 감안하면 고료가 센 편이다. 하지만 ‘띠지 베스트셀러 작가’라면 사정이 다르다. 띠지에 ‘누구누구 추천’이라고 이름을 박으면 화제가 될 만한 사람은 추천사 원고료가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요새 ‘과학도서 추천사 1순위’로 꼽히는 건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라는 게 출판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구독자 수가 50만 명 넘은 뒤 최 교수는 과학도서 추천사에 있어 독보적 섭외 1순위로 떠올랐다”며 “과학도서는 상대적으로 독자가 어렵게 느끼다 보니 대중의 호감을 산 유명인의 추천사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뇌 관련 도서는 정재승 KAIST 교수, 물리학 관련 도서는 김상욱 경희대 교수의 추천사가 인기다.
문학계에서는 신형철 평론가, 소설가 김금희 김연수 김초엽 이슬아 정세랑 최은영 등 강력한 팬덤을 갖춘 작가가 ‘S급’ 추천사 필자로 꼽힌다.
출판사에 띠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운송 과정에서 띠지가 찢기거나 구겨지기 쉽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띠지만 망가져도 하자품으로 보여 안 사는 독자가 많다”며 “파손을 막기 위해 책을 전부 비닐로 감싸놓기도 하는데, 환경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커지다 보니 종종 항의받는다”고 했다.
유명인의 추천사를 받는다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 출판사 편집자는 “제아무리 유명인의 추천사를 받는다고 해도 안 팔리는 책은 끝까지 안 팔린다”며 “취향과 관심이 다양화된 시대에 다수 독자의 선택을 동시에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서점가 불황에 추천인의 이름값이라도 빌리려는 출판사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출판사 편집자는 “비교적 이름과 얼굴이 덜 알려진 신인 저자의 첫 번째 책은 추천사 섭외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