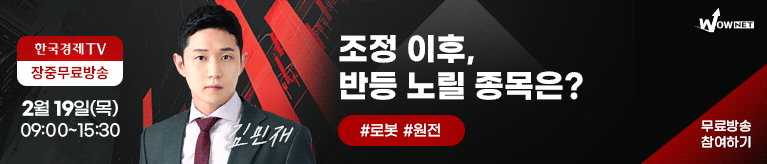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캔버스에 붙잡아둘 수 있을까. 어떤 화가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그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카메라를 통해 기록된 순간을 회화로 재차 남기는 ‘2차 기록물’일 뿐, 그 순간 자체를 캔버스에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캔버스에 붙잡아둘 수 있을까. 어떤 화가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그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카메라를 통해 기록된 순간을 회화로 재차 남기는 ‘2차 기록물’일 뿐, 그 순간 자체를 캔버스에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볼리비아계 미국 작가 도나 후앙카(43)는 ‘퍼포먼스 회화’라는 참신한 방식을 통해 찰나의 순간을 남긴다. 화려한 색깔의 페인트를 온몸에 칠한 퍼포먼스 연기자들이 흰 벽에 몸을 문질러서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연기자의 신체를 크게 확대해 걸어두기도 한다.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에서 열리고 있는 도나 후앙카 개인전은 그 결과를 모아놓은 전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곡면의 벽에 설치된 높이 6.4m, 길이 14.4m의 대형 회화가 관람객을 압도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블리스 풀’(2023)이다. 흰색 파란색 분홍색 등 여러 색깔의 페인트가 뒤섞인 추상화 12점이 빈틈없이 붙어 있다. 각각의 작품은 연기자들의 신체 일부분을 확대해서 찍은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확대한 사진을 프린트한 뒤 그 위에 모래와 섞은 페인트를 손으로 칠했다. 퍼포먼스, 사진, 회화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체의 한순간을 캔버스에 남겼다.
전시장 한쪽에 걸린 옷더미와 비닐도 과거를 기록하기 위한 노력이다. 후앙카는 “한국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든 옷을 태우는 풍습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옷을 입었던 사람의 에너지와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를 남겨두기도 한다. 전시장 안에 들어서면 상큼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은은하게 느껴진다. 남미 지역의 나무인 팔로산토와 태운 머리카락 향을 섞어서 만든 향이다. 볼리비아 이민자 부모 밑에서 고향의 신화를 들으며 자라온 후앙카가 자신의 뿌리를 향으로 나타낸 것이다.
후앙카는 왜 이미 지나간 시간을 자꾸만 잡아두려는 걸까. “저는 모든 시간이 연결돼 있다고 믿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두 과거에 영향을 받죠.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 안에 볼리비아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요. 제가 과거를 계속 ‘아카이빙’ 해두려는 이유예요. 관람객들이 제 전시를 볼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찬찬히 과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유료 전시지만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회화, 조각 등 20여 점이 전시되지만, 그중 회화작품 대부분은 서로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진다. 전시는 오는 6월 8일까지.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