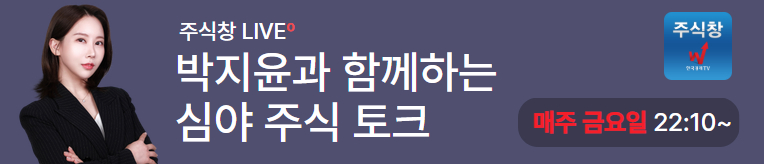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사 이후 크고 작은 조직에서 많은 리더가 새로 탄생했다. 김 회장님, 이 사장님, 박 상무님, 최 부장님, 정 팀장님…. 기업과 금융회사뿐 아니라 관공서, 학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을 다 따지면 새로 올라선 리더가 전국에 수만 명은 될 듯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인사 이후 크고 작은 조직에서 많은 리더가 새로 탄생했다. 김 회장님, 이 사장님, 박 상무님, 최 부장님, 정 팀장님…. 기업과 금융회사뿐 아니라 관공서, 학교,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을 다 따지면 새로 올라선 리더가 전국에 수만 명은 될 듯하다.대체로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맡은 조직을 그럭저럭 이끌고 있을 것이다. 전임자의 잘못을 봐 온 게 있고 스스로 결심한 것도 있고 해서 대부분 친절하고 성실한 상사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조직에서나 3월이 분수령이다. 이제 슬슬 성과를 내볼까 하는 의욕과 조바심이 동시에 생긴다. 연초 결심한 행동 수칙도 이제 잊혀지고 있다. 회의를 소집하는 일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다. 후배 직원을 불러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생긴다. 내가 더 잘 알고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성에 차지 않는다. 잔소리도 부쩍 는다. 속으로 생각한다.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반항하는 거야.’
급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기 시작한다. 단체 카톡방에 깨알같이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엔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를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터무니없다. 우선 오탈자가 있다. 그것부터 카톡방에 수정 지시를 내린다. 오탈자보다 더 큰 것은 요구한 게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카톡방에 남겨놓은 글만 10개 가까이 된다.
이른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예전엔 윗사람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됐지만, 요즘은 상사도 부하 직원에게 평가받는 시대여서 그렇다. 조직에서 큰일을 맡길 땐 리더십을 반드시 보고 반감이 강한 사람은 배제하는 게 요즘 세상이다.
디테일에 지나치게 강한 마이크로 매니저는 반감을 사기 쉽다. 업무 시간 외엔 지시하지 않고 갑질이나 인간적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호감을 얻기 힘들다. 구성원들은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아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도 뭔가 할 수 있고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 매니저 밑에선 이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마이크로 매니저 성향이 조금 보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큰 방향만 정하고 맡길 것, 가끔 진척 과정을 체크할 것, 엉뚱하게 가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히 바로잡을 것,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질 것 등이다. 스타일상 불가능하다고? 노력하면 바뀌는 게 스타일이다.
정치나 국가의 지도자는 기업 조직 등의 리더보다 더 큰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성원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서다. 국가 지도자는 통일(북한 이슈)과 외교, 인구 문제, 경제와 개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인다. 통신비가 적당한지, 은행이 독과점인지 등은 사안이 다소 작다는 비판이 많다. 사안이 작을수록 해당 분야 전문가를 넘어서기 힘들다.
은행만 예를 들어보자. 은행은 제도상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통제를 받는 만큼 5~6개만 있다고 해서 경쟁 제한은 아니며, 20개가 넘더라도 독과점 성격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는 경제학자가 많다. 경제학 책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 국가 지도자는 작은 동네에서 이들을 상대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