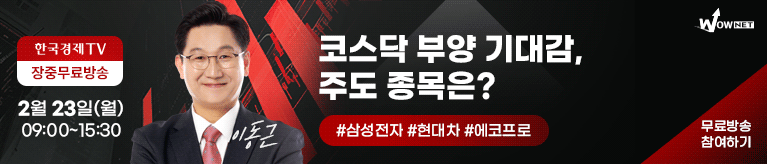24일 부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최근 중국 톈진시에 있는 법인을 정리했다. 중국에 구축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봉쇄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대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공급망 이슈도 이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점도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중국에서 철수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매각 승인을 미루는 등 절차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쎄보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중국 창저우에서 국내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각종 비용 및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중국 생산보다 국내 생산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전기차 제조 과정을 올해 9월께부터 전남 영광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뿐만 아니다. 국내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도 지난해 중국 법인을 정리했다.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만이다. 앞서 사드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중국 실적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 법인을 청산하면서 중국 백화점에서도 매장을 모두 뺐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지난해 6월 중국에 진출한 17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98개사(55.3%)가 사업 축소·중단·철수·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 수는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중국에 새롭게 진출한 국내 기업은 34개에 머물렀다. 이는 1992년 1분기 이후 3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