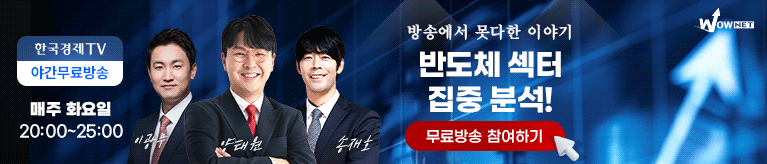골프업계에 따르면 친 공의 거리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맞바람이 뒷바람보다 두 배 정도 크다. 바람의 저항에 공이 위로 뜨게 만드는 ‘마그누스 효과(양력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다. 공이 클럽에 맞으면 백스핀이 걸린다. 백스핀 효과로 인해 공의 밑부분 경계층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맞바람)과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분다. 공의 윗부분에는 원래 부는 바람 그대로 맞바람이 분다.
이렇게 공의 위아래에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하면, 결과적으로 공의 아랫부분이 거꾸로 회전하면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을 양력 또는 마그누스 힘이라고 부른다. 반면 뒷바람에서는 공기 분자가 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저항력이 덜하다. 이 때문에 공이 낮게 뜨지만 더 멀리 날아간다.
바람은 공이 떨어진 뒤 구르는 거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맞바람에서는 런이 덜 발생한다. 통상 바람의 저항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이 높이 뜨기 때문이다. 높이 뜬 샷은 떨어질 때 급격하게 낙하하고 구르는 거리가 줄어든다. 반대로 뒷바람일 때는 낮은 샷이 나오고 낙하각도 완만해진다. 바람이 없을 때에 비해 ‘맞바람 샷’의 런은 절반 정도이며, ‘뒷바람 샷’의 런은 1.5배 더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을 읽고 대응해야 할까. 골프교습가 배경은 프로는 “그린 깃발이 바람으로 인해 완전히 펼쳐져서 펄럭이거나 주변 나뭇잎이 움직인다면 초속 5m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 의미”라며 “이런 바람이 앞에서 불면 한 클럽 정도 길게 잡고, 뒤에서 불면 반 클럽 정도 짧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깃대가 앞뒤로 크게 휘청인다면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다. 맞바람일 경우 두 클럽 이상 길게 잡고, 뒷바람일 경우 한 클럽을 덜 잡아야 한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