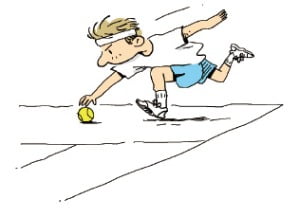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고향인 스위스 북부 도시 바젤. 이곳에는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스위스 인도어 바젤 경기장이 있다. 페더러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관련 스티커를 모으며 자랐다. 낡은 차고에서 나무 라켓으로 공에 바람이 빠질 때까지 ‘벽치기’도 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고향인 스위스 북부 도시 바젤. 이곳에는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스위스 인도어 바젤 경기장이 있다. 페더러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관련 스티커를 모으며 자랐다. 낡은 차고에서 나무 라켓으로 공에 바람이 빠질 때까지 ‘벽치기’도 했다.13세 때는 ‘볼보이’가 돼 스타들의 숨소리를 곁에서 들었다. 공을 코트에 굴리며 손 감각을 익혔고 경기 흐름을 포착하는 순발력과 판단력을 배웠다. 볼보이는 ‘지·덕·체를 겸비한 만능 서포터’라는 것도 체득했다. 무엇보다 승리와 좌절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년기의 다양한 운동 경험이 볼보이 훈련에 도움이 됐다. 그는 축구를 좋아해 이곳 구단인 FC 바젤에 들어갈 꿈을 꾸었고, 스키 수영 핸드볼 배드민턴 탁구를 섭렵했다. 이렇게 폭넓게 기반을 다진 뒤에 테니스로 진로를 정했다. 두 살 때부터 골프 교육을 받은 타이거 우즈와 달리 ‘늦깎이 스타’인 그는 이때의 기본기를 잊지 않았다.
그가 스위스 인도어 바젤에서 10차례나 우승한 비결도 어릴 때 익힌 볼보이의 감각이었다. 거기에서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와 부드러운 백핸드 슬라이스 등 예술에 가까운 기량을 꽃피웠다. 우승 후에는 꼭 볼보이들과 피자를 함께 먹으며 꿈을 북돋웠다.
그러면서 2001년 첫 투어 우승을 비롯해 프로통산 1251경기에서 승리했고, 최장 237주간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다. 2003년 이후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8회) 우승 등 역대 최초의 메이저 20승 고지에 올랐고, 2018년 최고령 1위(36세10개월) 기록도 세웠다.
그런 그가 이번 주말 레이버컵 대회를 끝으로 은퇴한다. 세 번의 무릎 수술과 불혹의 나이(41) 탓이다. 지난 7월 윔블던 센터코트 100주년 때 “한 번 더 윔블던에서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던 꿈마저 접었다. 그는 작별 인사에서 “바젤의 볼보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린 시절 초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그가 떠난 뒤에도 코트의 환희와 눈물은 이어지고, 꿈나무는 계속 자랄 것이다. 윔블던 코트엔 ‘승리와 좌절을 만나고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이라는 키플링의 시구가 적혀 있다. 이 또한 ‘황제 페더러’의 볼보이 시절과 함께 테니스 지망생 등 모든 청소년이 새길 만한 교훈이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