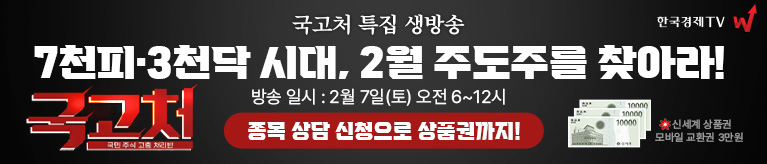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좌우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보수 진영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진보 진영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경쟁 완화, 시험 축소,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을 통한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수월성 교육을 비판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좌우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보수 진영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진보 진영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경쟁 완화, 시험 축소,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등을 통한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수월성 교육을 비판한다.교육에서 수월성은 엑설런스(excellence)를 번역한 말이다. 진보교육계는 이 단어에 이상하리만큼 부정적이다. 수년 전 한 신문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이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종류의 수월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인터넷판으로 먼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진보교육계의 한 지인이 ‘수월성’이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단어처럼 이미 보수 진영의 용어로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면 진영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쇄된 지면 판에는 수월성이라는 단어가 ‘4차산업혁명 대비 역량’으로 끝내 수정돼 나갔다.
교육에서의 수월성은 진영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종류의 수월성인지는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우선 ‘선발 효과’ 아니라 ‘학교 효과’에 의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진보 진영은 자사고·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며 선발권을 갖는 자사고·특목고의 폐지를 주장한다. 보수 진영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사전 선발이 불가피하다며 자사고·특목고의 선발권을 지키려 한다. 양측 모두 교육 성과의 결정적 요인을 ‘선발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 효과가 전혀 없어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뚜렷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국·영·수 학원이 전혀 없던 1980년대에 지방의 평준화된 도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다. 소위 뺑뺑이로 고등학교가 배정됐기에 사회·경제 수준 구성이 학교마다 비슷했다. 과외를 금지하던 시절이라 사교육은 거의 없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해 선발 효과도 전무했다. 그런데도 매년 다른 학교에 비해 입시 실적이 몇 배나 우수한 학교들이 있었다. 이처럼 같은 조건임에도 수월성을 구현해 내는 것이 ‘학교 효과’다. 치열하고 열정적인 교사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느슨하게 방치하는 교사와 학교도 있다. 교육계가 다퉈야 할 것은 선발권이 아니라 ‘어떻게 학교 효과를 모든 학교에서 만들 것인가’다.
수월성은 하위권을 위해서도 추구돼야 한다.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는 학력 저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는 사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학습 결손이 있으면 ‘나머지 공부’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시켰다. 학습 결손 보완도 공교육 교사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사교육이 일상화되면서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배워 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도 고소득 상위권은 별 영향이 없다. 문제는 사교육으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없는 하위권, 저소득층, 소외된 아이들의 경우다. 학교의 ‘나머지 공부’는 방과 후 수업이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학습 부진 부분을 맞춤형으로 추가 연습하게 했던 나머지 공부와 달리 방과 후 수업은 별도의 수업료를 내고 여럿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방식이라 개별 학습 결손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 완화, 학업 부담 감소를 아무리 외쳐도 학습 결손 누적을 해결 못하면 ‘아이가 행복한 교육’은 공허할 뿐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수월성이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인지 점검해야 한다. 수능 실력은 시대가 원하는 수월성이 아니다. 선진 지식을 흡수하는 기존의 수월성으로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 공부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정해진 정답만 맞히는 수월성을 넘어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발전시키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월성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에서 수월성은 진영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시대가 요구하는 수월성을 모두에게 길러줄 수 있는 ‘학교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이 다양한 방법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