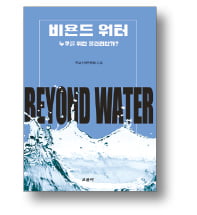 예부터 치수(治水)는 국가의 근간이었다. 1970~198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도시화를 위해 원활한 물 공급이 필수였다.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등 대형 다목적댐들이 지어졌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물관리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 무엇이 국민의 삶에 이로운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토의하기보다 상대 진영을 탓하는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예부터 치수(治水)는 국가의 근간이었다. 1970~198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물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도시화를 위해 원활한 물 공급이 필수였다.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등 대형 다목적댐들이 지어졌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물관리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 무엇이 국민의 삶에 이로운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토의하기보다 상대 진영을 탓하는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한국수자원학회가 펴낸 《비욘드 워터》는 물관리를 정치 영역에서 다시 기술의 영역으로 돌려놓을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물 관리를 갈등과 대립, 조정 등의 틀 속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면 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하천 공간의 다양한 활용, 이·치수를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노후 인프라의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70~1980년대의 물관리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 변화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연구팀이 세계 7250개 하천을 대상으로 40년 동안의 유량 변화를 조사했다. 일부 지역에선 물이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선 물이 많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한국 환경부도 기후 변화로 한반도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50년께에는 홍수량이 현재보다 11.8%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00년에 한 번 범람 가능한 확률로 설계된 하천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꼴로 범람할 확률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현재 물관리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물관리를 일원화한 결과다. 문제는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정책이다. 환경부는 몇 가지 수자원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사업 중 일몰되지 않고 넘어온 사업에 불과하다. 저자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펴야 한다며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있는 관리 노력을 뛰어넘어 국민이 물과 관련된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물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