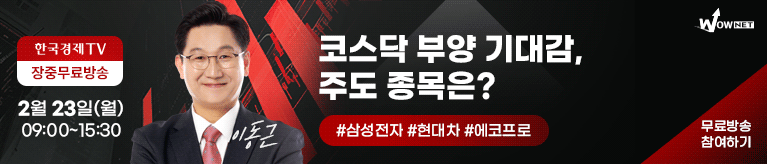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I는 GS건설에 S&I건설을 매각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S&I는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해 S&I건설을 세웠다. GS건설이 이 회사 지분 50% 이상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S&I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1조506억원이다. 매각 금액은 3000억원 중반 수준으로 거론된다.
LG그룹은 연말부터 시행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직접 보유한 ㈜LG만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LG의 100% 자회사인 S&I까지 범위가 넓혀진다.
S&I건설은 주로 LG 계열사의 플랜트, 연구시설, 클린룸 설비 건설 등을 맡았다. 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 보니 이번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발주 과정에서 LG 계열사의 내밀한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에 매각 대상을 정하는 일도 난제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그룹 내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 신뢰를 쌓아온 GS건설이 낙점돼 단독 협상이 이뤄졌다.
LG그룹과 GS그룹 간 상호 인수합병(M&A)의 첫 사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두 그룹은 2004년 분할 당시 향후 5년간 각 그룹이 담당하는 동종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고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졌다. 계열 분리 이후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M&A 시장에 나왔지만 LG그룹은 GS그룹과의 ‘동업자 정신’을 존중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 LG건설’의 완성이란 상징성도 확보하게 된다. GS건설의 전신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1969년 자본금 1억원을 들여 세운 락희개발이다. 1995년엔 LG건설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2005년 LG그룹과 GS그룹 계열 분리 과정에서 지금의 GS건설이 됐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시공능력 10위권 안팎에 머물렀지만 GS그룹 편입 후 매출 규모 10조원에 달하는 종합건설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LG그룹에 정통한 관계자는 “GS건설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