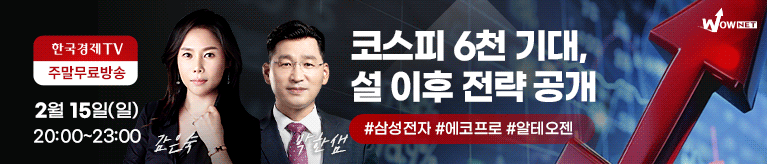커피나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지방에 약 40종이 자생한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세계 1, 3위 커피 생산국이지만 남미에 커피나무가 전해진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마침 두 나라는 커피 재배가 가능한 ‘커피 벨트(coffee belt, 남·북회귀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커피 대국’이 됐지만 요즘 세계인이 마시는 커피 원산지는 모두 아프리카다.
커피나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지방에 약 40종이 자생한다.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세계 1, 3위 커피 생산국이지만 남미에 커피나무가 전해진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마침 두 나라는 커피 재배가 가능한 ‘커피 벨트(coffee belt, 남·북회귀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커피 대국’이 됐지만 요즘 세계인이 마시는 커피 원산지는 모두 아프리카다.전 세계 커피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아라비카(arabica)는 말 그대로 커피의 원조다. 해발 2000m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인 ‘카파’ 지역에서 7~8세기 처음 발견됐다고 한다. 커피라는 이름도 바로 ‘카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아라비카와 커피시장을 양분하는 또 다른 품종은 로부스타(robusta)로 콩고 원산이다. 아라비카에 비해 재배조건이 덜 까다롭고 카페인이 2배 정도 많다. 세계 2, 4위 생산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그런데 원조격인 아라비카가 2040년께면 멸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떠돌기 시작했다. 영국과 에티오피아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지대에서 자라는 아라비카종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피해로 자칫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커피의 카페인은 일종의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하는데 아라비카는 로부스타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적어 각종 해충에 취약하다. 아라비카가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것도 일교차가 커 저지대에 비해 병충해가 덜하기 때문이다. 실제 17~18세기 유럽인들은 커피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라비카를 저지대로 옮겨 심었지만 대부분 죽었다. 상대적으로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가 부상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로부스타는 아라비카에 비해 향미와 품질이 떨어진다.
아라비카를 생산하는 커피 농가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보니 온난화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할 여력이 거의 없다. 보다 못한 커피업체들이 혹시 모를 멸종을 막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조금 비싸더라도 커피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통해서다. 국내 3대 커피 수입사인 SPC그룹 역시 이를 통해 커피 원두의 품질도 높이고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커피업계와 농가의 협력 체제가 ‘윈윈 게임’으로 이어져 지구촌 전체가 오랫동안 ‘아라비카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