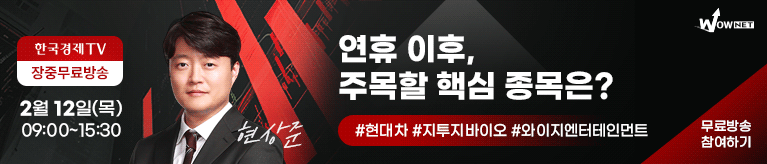2년전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던 직장인 서모씨(36)는 최근 전세 만기 연장을 앞두고 추가 대출을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집주인이 요구한 1500만원의 추가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으려 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카뱅 측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전산 시스템상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던 서씨는 결국 연 2.13%의 전세 대출 금리를 포기하고, 연 3.65%의 신용 대출을 받아 차액을 메꿨다.
서씨는 “타 은행에서 계약을 완전히 새로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녀와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라며 “금리도 저렴했지만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은행을 선택한 것인데, 전산 미비로 대출을 못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카카오뱅크의 전세 대출 이용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썩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가 대출시에도 전입 신고를 새로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탓이다. 이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가 더 높은 신용 대출을 받거나 대형 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난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카뱅 전세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카뱅은 현재 전세 만기 연장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가능한 한도가 남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전세 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시 전산상에 신규 전입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세금 추가 대출을 믿고 연장 준비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내달 전세 만기를 앞둔 직장인 정모씨는 "연장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카뱅에서 추가 대출은 어렵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금리 부담이 갑자기 1%포인트 이상 늘 것 같아 벌써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위는 서면 답변에서 “대부분의 은행은 전세 연장시 추가 대출을 할때 전입 신고를 새로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며 “비대면 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카뱅)에서는 전산 미비와 내부 정책 영향으로 증액된 액수만큼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설명했다.
단 “다른 은행에서 증액된 액수를 포함한 전세 대출을 다시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대출 상품이 출시될경우 약관은 점검하지만 절차나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추가 전세 대출 불가 문제에 대해 당국이 카뱅 측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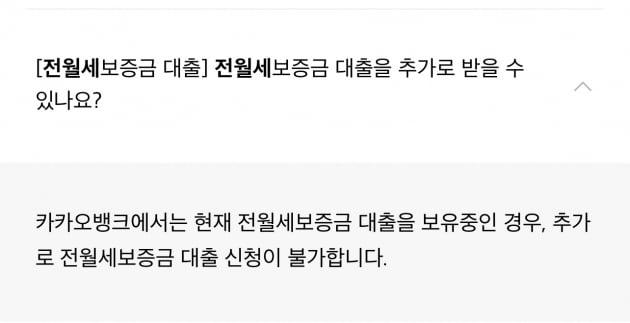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금 추가 대출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뱅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타 은행에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세 대출을 재차 알아봐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카뱅의 전세 대출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뱅은 '사흘 안에 전세 대출 심사 결과를 알려준다'고 마케팅을 해 왔으나 최근 대출 심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한 바 있다. 신청자가 늘면서 심사가 최대 몇주까지 늦어졌고, 대출 승인을 기다리던 고객들이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
윤주경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전산미비로 추가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전세 대출 연장시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현재 대출 연장시 증액 대출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경우의 수와 더 많은 정보량을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된다"며 "완전 비대면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장과 증액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