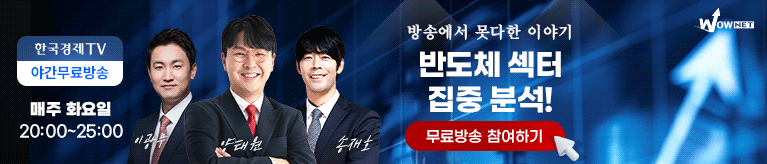국회는 24일 새벽 3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
국회는 24일 새벽 3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하지만 전날 저녁 정부에선 이 같은 추경 규모를 설명하는 데 혼선이 빚어졌다. 추경 사업 규모가 커졌으니 추경 규모가 늘었다는 설명과 본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총지출이 변하지 않아 추경 규모에도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논란 끝에 정부는 34조9000억원을 공식적인 추경 규모로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매년 달라지면서 각기 다른 설명이 나왔다는 것이다.
고무줄 추경 규모
올해 초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추가경정예산규모 산정방식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이후 작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총 규모 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규모가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추경 예산 규모는 세출과 세입, 기금 부문으로 구분된다. 세출은 사업 예산, 즉 지출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차례의 추경 예산에서 세출 증액분과 감액분을 상계해 순증감액으로 추경 규모를 제시한 것은 2005년이 유일했다. 2006~2020년 1차 추경까지는 감액 자체가 없어 증액분만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2차 추경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세출 예산을 깎아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세출 감액분이 발생했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고 증액분만 추경의 규모로 산정했다. 작년 2회 추경의 정부안을 보면 3조6000억원의 본예산 사업을 줄여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국비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돼있다. 2005년의 기준이었으면 규모는 4조원이었겠지만 이때는 7조6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2차 추경에서 혼선을 빚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2005년 기준이라면 33조원이 맞고, 최근 기준이면 34조9000억원이 맞는 것이다.
세금이나 기금 등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혀 예산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세입 증액분과 감액분을 모두 고려한 순증감분을 반영한 것은 2009년 한차례 뿐이었다. 나머지는 세입 증액경정은 반영하지 않고 감액일 경우에만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에는 감액만 반영하면서 일부 세목을 누락했다. 2013년과 2020년 1회 추경에는 세입 증액 요인이 없어 감액분만 포함됐다. 2015년과 2020년 3회에는 세입 증액 요인이 있었지만 감액경정만 규모에 포함했다. 2016~2019년, 2020년 2,4회 때는 세입 증액이 있었지만 총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은 국회에 변동사항이 보고된 부분만 추경 규모에 반영됐다. 원래는 20% 이상 변경시에만 국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그 이하만큼의 변동시에는 국회 보고를 통해 추경에 포함하는 경우와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했다.
국채 상환 등 기타 요인을 추경 규모에 포함한 적도 있었다. 올해 2차 추경에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추경 규모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대비를 이룬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금은 별다른 기준없이 추경 규모에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
올해 2회 추경 규모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34조9000억원 규모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각 연도별 기준에 따라 적게는 33조원에서 많게는 36조9000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33조원이라는 주장은 2005년처럼 세출 규모 확대를 본예산의 지출 감소분 1조9000억원과 상계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36조9000억원은 2017년처럼 국채상환 규모를 추경 규모에 포함하는 경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온 추경규모는 국가지출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개념"이라며 "일관된 기준을 통해 작성되는 수치가 아니기에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세출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을 상계한 세출 순증감액을 추경 규모로 제시하고, 각각의 규모를 추경안에 설명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세입은 예측의 영역이므로 원천적으로 추경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