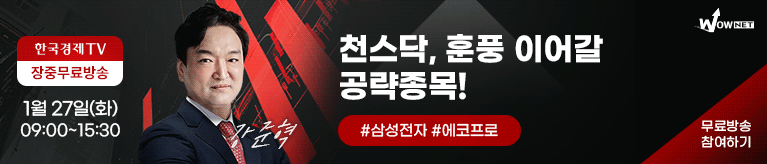제품을 받기까지 두 달이나 걸리는 슈트가 있다. 3대 명품 슈트로 불리는 ‘키톤’ ‘브리오니’ ‘제냐’다. 모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명품 슈트 브랜드다. 최소 150수 이상으로 만들어져 부드럽고 가벼우며 촉감이 매끄럽다. 이들 기성복 가격은 400만~900만원대. 가격이 비싸 대중적이진 않지만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다. 브리오니 관계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에 즐겨 입어 유명해진 브랜드”라며 “나이대가 있는 50~60대 최고경영자(CEO)들과 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찾는다”고 했다.
아무나 못 입는 명품 슈트의 세계
 키톤과 브리오니, 제냐의 맞춤 슈트를 사기 위해선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정확한 치수를 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수석 테일러들이 3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다. 테일러는 매장에 온 소비자의 어깨너비와 허벅지 치수 등 체형을 잰다. 이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직업과 취향을 묻는 1 대 1 상담을 한다. 라이프스타일을 알아야 그에 맞는 소재와 스타일을 추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슈트, 재킷, 코트 등에 사용되는 원단은 900여 종에 달한다.
키톤과 브리오니, 제냐의 맞춤 슈트를 사기 위해선 최소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정확한 치수를 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수석 테일러들이 3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한다. 테일러는 매장에 온 소비자의 어깨너비와 허벅지 치수 등 체형을 잰다. 이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직업과 취향을 묻는 1 대 1 상담을 한다. 라이프스타일을 알아야 그에 맞는 소재와 스타일을 추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슈트, 재킷, 코트 등에 사용되는 원단은 900여 종에 달한다.신체 치수는 이탈리아 장인들에게 전달한다. 이들은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슈트를 만들어 한국에 보낸다. 한 벌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4일. 맞춤 슈트 가격은 1000만원대다. 원단과 단추 등에 따라 가격은 또 달라진다. 제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맞춤 슈트를 만들고 있다”며 “고가 제품인 만큼 매년 찾는 단골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키톤, 브리오니, 제냐는 슈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브랜드다. 3대 명품 슈트로 불리지만 제각기 특색이 있다. 키톤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태어난 패션회사인 만큼 원색을 사용해 생동감 있고 자유분방한 느낌이다. 꼭 맞는 허리 라인,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짓단 등 남성적인 섹시함을 강조한다. 최근 대세가 된 ‘이탈리아 핏’의 대명사다.
브리오니 슈트는 네이비, 그레이 등 튀지 않는 색을 사용해 점잖은 것이 특징이다. 바지폭은 넓지도 좁지도 않다. 나이대가 높고 격식 있는 비즈니스 자리를 자주 하는 대기업 임원이나 회장들이 찾는 브랜드다. 제냐는 다른 남성 슈트 브랜드에서 원단을 구매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기존 슈트보다 허리와 가슴이 타이트하고 어깨가 덜 두드러진다.
MZ의 명품슈트 톰포드, 톰브라운
 최근에는 미니멀한 슈트가 유행이다. 고급 소재를 쓰되 과한 디테일보다는 여유 있는 디자인이 이들 슈트의 특징. 배우 리처드 기어가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입은 아메리카식 슈트가 대표적인 예다. 20~30대 MZ세대들이 미국 ‘톰포드’ ‘톰브라운’ 등 신명품을 찾으면서 이런 슈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미니멀한 슈트가 유행이다. 고급 소재를 쓰되 과한 디테일보다는 여유 있는 디자인이 이들 슈트의 특징. 배우 리처드 기어가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입은 아메리카식 슈트가 대표적인 예다. 20~30대 MZ세대들이 미국 ‘톰포드’ ‘톰브라운’ 등 신명품을 찾으면서 이런 슈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톰포드는 영화 ‘007’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가 입고 나와 유명해졌다. 톰포드 관계자는 “30대 이상 전문직과 밀레니얼 세대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톰포드는 ‘빌드업 숄더’라고 불리는 어깨 끝이 살짝 부풀어 오른 듯한 모양이 특징이다. 색상도 검은색을 사용해 권위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풍긴다. 바지엔 ‘사이드 어드저스트’가 있어 따로 벨트를 하지 않아도 셔츠가 빠져나오지 않는다.
‘슈트계의 악동’이라 불리는 톰브라운은 2001년 미국 뉴욕 웨스트빌리지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다. 1950~1960년대 오피스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로 복숭아뼈가 보일 정도로 바지 길이가 짧다. 국내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져 2017년 이후 매년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20% 성장했다.
최근 슈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과 복장이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등장 때문이다. 하지만 슈트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패션업계는 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스트리트 패션에서 다시 격식을 갖춘 패션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2~3년 뒤 길거리에서 슈트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