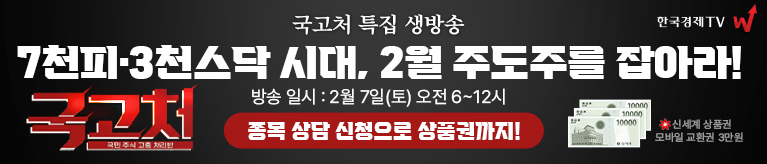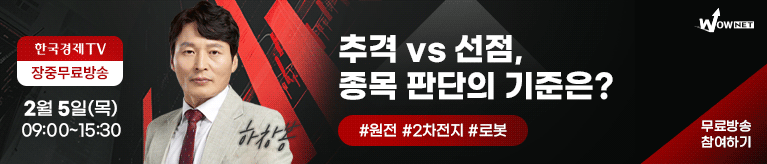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이 "인권침해라 생각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김모씨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주변에 술병이 많아서 술 마시고 두고 간 걸로 생각했다"며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심지어 많이 주우면 한 달에 세 개도 줍는다. 그래서 그게 당사자 그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는 (물이나 비에)젖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식당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납하던 동료와 얘기하던 중(생각이 나), 잊어버린 채 보관 중이었던 휴대전화를 꺼내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라 생각해 거부했다"고 했다.
친구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손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이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에도 오전 3시 36분께 이후에는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부모와 통화를 마치고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둔 이후 이를 옮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를 습득한 환경미화원 김씨는 지난달 10~15일 사이 공원의 잔디밭에서 휴대전화를 주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개인사물함에 넣어뒀다가 지난달 30일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팔이 아파 병가를 내는 등 개인적인 일로 당시 습득한 휴대전화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A씨는 손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했다.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한강공원 인근에서 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