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빨리 준비하세요. 5월20일엔 계약 마무리 해야 합니다."
웹툰 서비스 '픽코마'를 운영하는 카카오재팬 투자를 두고 카카오와 PEF운용사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대치하던 현장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불과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요구 조건을 두고 팽팽히 싸워오던 협상장에서 갑작스럽게 20일이 계약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카카오 실무진들과 투자자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다시 서류를 들춰다봤다고 전해집니다. 서둘러도 5월 말은 돼야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카카오 측이 갑자기 시한을 정해서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죠.
카카오는 왜이리 서둘렀을까? 그 궁금증은 같은 날 장 마감 시간 이후에서야 단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네이버웹툰이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2000억원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입니다. 네이버가 기존 주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각출한 날에 맞춰 카카오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음과 동시에 8.8조 몸값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을 대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웹툰'은 최근까지 네이버·카카오 양 사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카카오가 일본 내 플랫폼 '픽코마'가 네이버 측의 '라인망가'를 제쳤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데 이어 11월엔 픽코마가 글로벌 1위 플랫폼이 됐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즉각 네이버에서도 "우리가 조사해보니 글로벌1위는 우리다"라 반박했죠. 업계에선 이해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가 "픽코마는 꼭 잡아라" 특명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참고기사 : 카카오 日, 네이버 美서 '질주'…서로 "내가 웹툰 세계 1위")

일단 20일 펼쳐진 '웹툰 전쟁'은 외견상 카카오의 판정승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주대상 증자를 진행한 네이버웹툰과 달리 '제3자배정' 증자 방식으로 '라이언과 친구들'(Ryan&Friends)이란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8조8000억원'이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귀여운 이름과 달리 SPC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제도에 설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전보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웹툰의 경쟁력은 분명합니다. 투자에 기웃거리려 앱을 깔아봤던 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있더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애간장을 태우는 과금 서비스는 분명 카카오만의 매력입니다.
문제는 몸값입니다. 협상 초창기부터 카카오가 요구하는 기업가치만 최소 6조원을 훌쩍 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5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PEF 특성상 그래도 성공했다 평가받는 '연 복리 8% 이상'을 거두려면 원금 대비 두 배가까이 기업가치가 불어야 하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된다는 PEF들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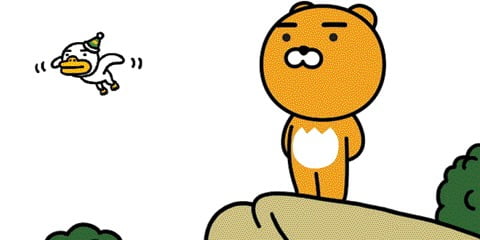
그러다보니 짖궂은 PEF업계에선 "카카오가 앵커PE에 (이미 앵커가 투자해 놓은) 카카오M과 카카오뱅크에서 곧 대박날테니 이번엔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더라도) 좀 도와달라 한 것 아니냐"는 뒷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각 펀드별 투자자(LP)가 동일하지 않으니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앵커PE뿐 아니라 여러 PEF가 투자제안을 해 최종 8조8000억원까지 몸값이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성장성이 확실한 분야는 웹툰이라는 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죠.
다시 카카오와 네이버간 신경전으로 돌아가면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가 첫 글로벌 경영권 인수 거래이자 대형 M&A인 미국 왓패드 인수와 향후 시너지를 발표하는 당일 카카오는 타파스·래디쉬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맞불을 놓습니다.(사실 그날 당일 어디가 발표를 먼저하기로 했는 지는 아직도 미궁 속입니다).
심지어 같은 물건을 두고 M&A 협상장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국내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인수전이 대표 사례입니다. 매각주관을 맡은 IB와 문피아 주주들은 함박웃을 지을 일이죠. 양 사 실무진 사이에선 "올해 카카오(혹은 네이버)보다 M&A 한 건은 무조건 더 해야한다"는 구호도 나온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애가 타겠지만 제3자 입장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존심 싸움이 이마가 찌푸러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TV 화질, 세탁기 품질, 배터리에 이어 보톡스 균주를 두고도 치열하게 국내기업끼리 다퉈왔다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내수용' 취급받던 카카오가 글로벌 진출에 명운을 걸어 도전하고, 촘촘한 규제의 늪 속에서 '트집잡힐 일 벌리지 말자'가 문화가 됐던 네이버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M&A로 응전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이들은 진화 중입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