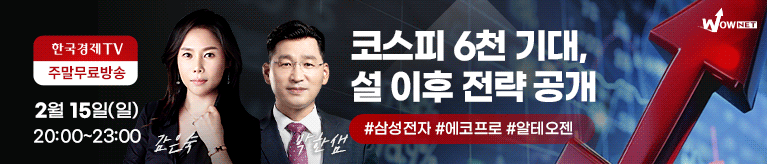1988년 10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반도체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던 서른다섯 살의 황창규 전 KT 회장(사진)은 열흘 동안 일본을 방문했다. 반도체 기업 여섯 곳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히타치연구소 부소장과 저녁을 함께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해 묻자 부소장은 “삼성전자는 수준 미달이며 아마 한참 동안은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얼마 전 자신에게 들어온 삼성전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1988년 10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반도체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던 서른다섯 살의 황창규 전 KT 회장(사진)은 열흘 동안 일본을 방문했다. 반도체 기업 여섯 곳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히타치연구소 부소장과 저녁을 함께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해 묻자 부소장은 “삼성전자는 수준 미달이며 아마 한참 동안은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얼마 전 자신에게 들어온 삼성전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황 전 회장이 최근 출간한 《빅 컨버세이션: 대담한 대담》은 지난 30여 년간 그가 만났던 인물들을 점과 선으로 삼아 그려낸 자서전이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대신 자신에게 큰 가르침과 영감을 준 인물들과의 크고 작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연스레 드러낸다. 책의 각 장(章) 제목이 이를 짐작게 한다.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선택하라, 이건희’ ‘뜨거움은 가슴에 품은 명확한 비전에서 나온다, 스티브 잡스’ ‘편집광이 내일의 성장을 이끈다, 앤디 그로브’….
저자가 세계 최초의 256M D램 개발을 이끄는 등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초석을 쌓았던 만큼 고(故)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에 대한 회고도 빼놓을 수 없다.
 “황 사장이 지금 투자를 안 하면 후배들은 언제 1등을 해보고 글로벌 1등을 지킬 수 있겠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했던 12인치 웨이퍼 양산 설비 투자를 앞두고 그가 선뜻 결심하지 못할 때였다. 이 회장은 이 한마디로 그를 깨우쳤다. 이를 통해 ‘미래는 통찰하고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
“황 사장이 지금 투자를 안 하면 후배들은 언제 1등을 해보고 글로벌 1등을 지킬 수 있겠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했던 12인치 웨이퍼 양산 설비 투자를 앞두고 그가 선뜻 결심하지 못할 때였다. 이 회장은 이 한마디로 그를 깨우쳤다. 이를 통해 ‘미래는 통찰하고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저자는 말한다.황 전 회장은 “후발 주자로서 앞서 달리는 선발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며 “만일 그 길을 홀로 가야 한다고 했다면 나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반도체업계의 다윗에 불과했던 삼성전자가 여러 골리앗을 차례로 제쳐나갈 수 있었던 공로를 함께한 동료들에게 돌린 것이다. 선진 일본 업체들의 기술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삼성전자 연구원들과 별도 연구 조직인 ‘기술 교류회’를 조성해 히타치, 도시바, NEC 등을 일일이 찾아다녔다는 설명이다. 이런 ‘발품’을 바탕으로 회사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임원들을 모은 ‘플래시 연구회’도 발족할 수 있었고, 플래시 메모리의 미래 사용처를 미리 연구해 반도체업계에서의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 있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조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의 열망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술력이 앞선 기업의 엔지니어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내가 한 것의 전부였다. 이런 외부 자극에 그들은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미스터 반도체’ 황 전 회장이 글로벌 IT 거물들과의 만남에서 배운 비즈니스와 삶의 교훈은 책 곳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전해준다.
홍선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