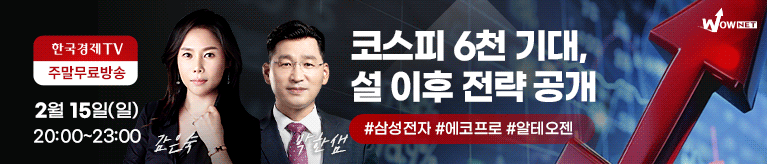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100일간 보여준 것은 논란과 구설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논란이 수사능력과 공정성 등 조직의 존재가치와 직결된 문제여서 심각성을 더한다. 공수처 검사 15명 중 수사경험이 있는 평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 공수처장이 ‘4월 중에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감감무소식인 배경일 것이다. 밀려드는 사건 중에 무엇을 먼저 수사할지 기초조사 중이라는 해명도 미덥지 못하다. 사건 경중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에 밀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실토처럼 들린다. 이래서는 ‘수사절차가 생명’인 고위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에는 손도 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건 공수처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 처장은 피의자(이성윤)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내주고는 ‘면담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황제 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원전 비리’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은 모두 공수처에서 틀어쥐고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키우고 말았다.
공수처는 정치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여서 자칫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개념을 들이밀었다. 대등한 수사기관 간 협력과 견제라는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을 ‘공소권 없는 하급기관’처럼 대한 것이다. 이러다간 정치권 기득권자들의 치외법권이 만들어질 것이란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공수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