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4년 실스(Sealth) 추장은 거주지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땅을 팔다니? 대지와 자연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 우리 삶 그 자체였는데, 사고판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원주민의 비통함을 뒤로한 채 결국 이 땅은 이주민의 소유가 됐고, 이렇게 넘어간 시애틀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를 배출하기에 이른다.
1854년 실스(Sealth) 추장은 거주지를 팔라는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땅을 팔다니? 대지와 자연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고 우리 삶 그 자체였는데, 사고판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원주민의 비통함을 뒤로한 채 결국 이 땅은 이주민의 소유가 됐고, 이렇게 넘어간 시애틀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를 배출하기에 이른다.미국의 저명한 논픽션 작가 사이먼 윈체스터는 《토지(Land)》에서 근대 서구사회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갈구해온 여정을 통해 현대 문명의 찬란한 과실의 근저에 땅의 사유화 또는 국유화를 둘러싼 수많은 비극과 희극, 불합리와 합리가 뒤섞인 고통의 역사가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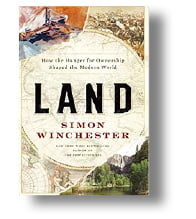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평생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넓은 대지에서 두둑한 소작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평생토록 동류의 사람들과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젠틀맨(gentleman)’이다. 이 단어는 잉글랜드의 토지 소유 계급 ‘젠트리’에서 나왔다. 상업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젠트리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11세기 잉글랜드의 토지조사 기록문서 ‘둠스데이 북(Domesday Book)’에 의하면 정복자 윌리엄 1세에게서 토지를 하사받은 200여 명이 그 기원이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평생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넓은 대지에서 두둑한 소작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평생토록 동류의 사람들과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젠틀맨(gentleman)’이다. 이 단어는 잉글랜드의 토지 소유 계급 ‘젠트리’에서 나왔다. 상업으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젠트리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11세기 잉글랜드의 토지조사 기록문서 ‘둠스데이 북(Domesday Book)’에 의하면 정복자 윌리엄 1세에게서 토지를 하사받은 200여 명이 그 기원이었다.역사상 모든 권력은 토지를 정복 또는 강탈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산업혁명기에 스코틀랜드 서덜랜드 지역의 조지 그란빌 레베슨-고워 공작은 지금도 현지인 사이에서 유대인 강제이주를 자행한 히틀러에 비견되는 악마로 간주된다. 그는 당시 돈이 되는 양모사업을 위해 토착 농민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거시킨 뒤 일대를 양 방목지로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땅이 그들 눈에는 희망의 신천지였을지 몰라도 죄 없는 원주민들에게는 땅을 빼앗기는 비극의 서막이었을 뿐이다. 도대체 유럽인들은 무슨 명분으로 신대륙 땅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그 기원은 15세기 교황이 포르투갈 선단에 발급한 ‘발견 칙서’에 있었다. 이후 아프리카, 남미, 북미의 땅들이 차례차례 신의 뜻(?)으로 유럽인의 소유가 됐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획득한 광활한 토지를 19세기 후반 철도회사에 매각했고, 철도회사는 다시 철로 인근의 땅을 시민들에게 매각했다. 요지일수록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렇게 개발 대상지는 하나씩 투기 대상이 됐다. 토지 소유는 재산 증식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창조와 탐구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1862년 미국에서는 ‘모릴 법(Morrill Act)’을 통해 주별로 기증받은 국유지를 재원으로 주립대학교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20세기 지식경제를 선도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영국 경제사상가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담장을 두른 사유지의 가축은 포동포동하고 작물 생산성이 높은데, 담장이 없는 공유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땅이 아니면 굳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1968년 개럿 하딘이 사이언스지(誌)에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 개념은 이후 토지의 ‘사유 대 공유’ 사이에 끝없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토지 소유에 대한 갈망은 분명히 성장과 풍요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1879년 헨리 조지는 정부가 부과하는 온갖 종류의 세금을 다 철폐하는 대신 ‘토지가치세’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 때문에 생기는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해결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어떤 토지제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돌이켜볼 때 땅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도덕이나 이념을 내세워 부정하는 것은 잘못임을 느낄 수 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시민은 똑같다. 그들은 단지 땅에 대한 기회를 반칙과 특권으로 빼앗아가는 자들을 증오할 뿐이다.
송경모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