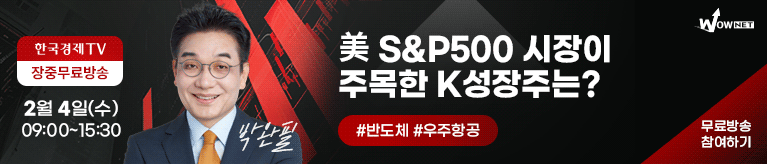특히 합법적 서비스였던 ‘타다’가 ‘타다 금지법’이라는 사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이 되고 끝내 중단되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 신산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을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고 온갖 사전 및 사후 규제로 옥죄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빅테크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판도가 급변하는 요즘에도 이런 규제 본능이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플랫폼노동자보호법 등은 모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처럼 덩치 큰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에도 규제 그물망을 피해 본사를 해외에 세우거나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유통·물류·IT업체 등 여러 업종이 합종연횡하는 등 신규 사업 참여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사업 영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인 53개가 한국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조건부로만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혁신은 사라지고 성장엔진도 꺼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는 고비용 저효율에 생산성이 낮은 산업만 남게될지도 모른다. 마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공장 증설과 관련, 국내에 이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의 공장을 더 해외에 뺏기면 안 된다. 민주당의 경제 성공 의지를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성을 담아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을 엄살로 치부해선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