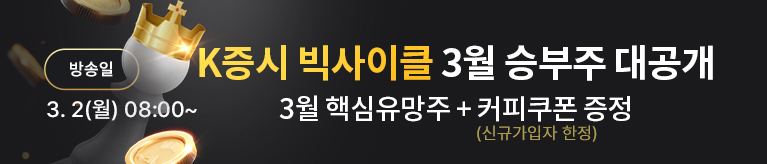‘모바일 세대’가 종이 상품권(유통전문가들은 이를 지류(紙類)상품권이라고 부른다)에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불편함 탓이다. 왜 그럴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의 예를 들어보자. 신세계는 모바일 상품권 없이 종이 상품권만 내놓는다. 그래서 SSG닷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신세계상품권(정확히는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선물받으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걸 사용하려면 먼저 가까운 신세계 계열 매장부터 찾아야 한다. 거기서 실물 상품권을 받은 뒤 상품권 뒷면에 있는 숫자를 쓱페이 앱에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만 이럴까.
현대백화점도 종이상품권만 판매하고 있다. 자사 쇼핑몰인 H몰에서 상품권을 쓰려면 백화점에 가서 H포인트로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따로 발행한다. 그런데 호환이 불가능하다. 종이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롯데쇼핑이 쿠팡의 대항마라며 작년 4월 출범한 롯데온에서조차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도 굳이 종이 상품권을 써야 할 경우라면 등기로 실물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불편해서 상품권을 쓰겠느냐”는 불만이 쏟아지자 롯데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은품을 상품권 대신 엘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복잡한 상품권 정책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 고객은 영구히 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달 사장단 회의에서 “(오프라인 쇼핑에서 거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과감히 버리라”고 강조했다. ‘오너’의 절박함이 현장에 전달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 고객은 영구히 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달 사장단 회의에서 “(오프라인 쇼핑에서 거둔) 과거의 성공 경험을 과감히 버리라”고 강조했다. ‘오너’의 절박함이 현장에 전달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