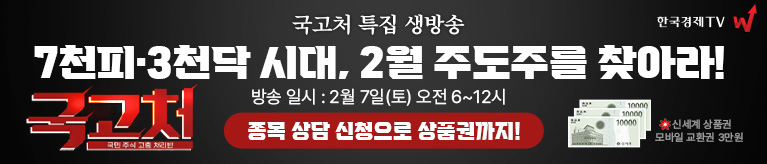마시는 수액(경구수액) 제품으로 유명한 링거워터는 최근 사명을 제품명과 같은 링티로 바꿨다. 기존 회사 명칭에 ‘링거’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돼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치뤘기 때문이다. 링거워터의 이원철 대표는 “사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했다.
◆과대광고 논란에 매출 급감
 이 대표는 2017년 마시는 수액이란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링거와 워터(물)를 합쳐 사명을 지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문도 받았다. 이 대표는 “제품 이름에 링거가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만 회사 이름으로선 괜찮다는 식약처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마시는 수액이란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링거와 워터(물)를 합쳐 사명을 지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문도 받았다. 이 대표는 “제품 이름에 링거가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만 회사 이름으로선 괜찮다는 식약처의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식약처의 단속을 받았다. 제품 내부 포장지와 설명서에 표시돼 있던 ‘링거워터’란 문구 때문에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일반적으로 수액(링거)는 주사를 통해 혈관에 주입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취급받지만, 입으로 먹는 경구 수액의 경우 식품으로 허가받아 유통되고 있다.
현행 상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명칭이나 영업소의 명칭, 성분 등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이 대표는 “2019년 개정된 상품표시광고법에 ‘영업소 명칭’도 법 안에 규정돼 식약처 입장을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며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뒤 링거워터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며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의 고발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그뒤 다행히 영업정지는 면했지만 회사와 제품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가 수 천만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는 “위탁생산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링거워터가 과태료 금액을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발표 이후 회사 매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발표 직전 월 18억원까지 늘었던 매출은 이후 월 1억~2억원까지 쪼그라 들었다. 이같은 상황은 이듬해(2020년) 3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는 “식약처의 발표 이후 이미 구매를 했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며 “회사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조건없이 환불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사명 선정 제약 여전히 커
이 대표는 특전사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2017년 링티를 개발했다. 한겨울 야외 훈련을 나가면 탈진하는 군인이 나왔는데, 처방용으로 가져간 링거가 추운 날씨에 얼기 일쑤였던 게 개발 계기였다. ‘입으로 마시는 수액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한 그는 군 내에서 동료 군의관들과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섰다. 제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기존 수액 주사 등을 부업으로 했던 의료계의 반발도 있었다. 그뒤 사명 논란을 겪으며 그는 한때 ‘사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회사는 현재 회복세에 있지만 당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한때 원형 탈모가 왔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이같이 사명과 관련 법률 위반 논란이 불거진 곳은 링거워터 뿐만이 아니다. 의약품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발표했던 스타트업 배달약국도 작년 말 이름을 ‘닥터나우’로 바꿨다. 약사법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명칭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일부 약사들이 업체를 신고했고,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혀 해석해 상호 선정 자유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