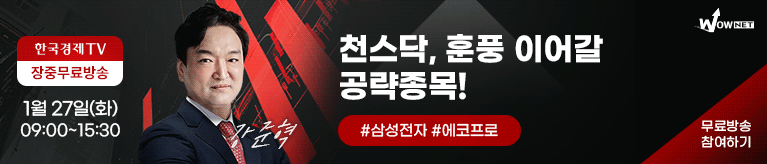-노후차, 폐차보다 운행거리 제한이 보다 현실적
-클래식카,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어
갤로퍼, 무쏘, 코란도,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로디우스, 포터Ⅰ, 봉고 프론티어. 이들 차종은 너무 오래된 경유차라는 이유로 내년 3월까지 도심 운행이 제한된다. 그래서 해당 차종 소유자의 반발도 거세다.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싶어도 제품 자체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데 운행 제한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이다. 그러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치단체들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향후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면 장착하시겠습니까?"를 묻고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운행을 임시로 허용했다.
-임시는 임시일 뿐, 운행은 중단
그럼 언제까지 운행할 수 있을까? 원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2021년 3월까지 운행을 허용했지만 서울은 달랐다. 저감장치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 자체를 금지시켰다. 게다가 토일 및 공휴일도 운행 금지를 명령했다. 녹색 교통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16.7㎢이며,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혜화동 및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저감장치 미개발이다. 서울시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의 운행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설정했고 더이상 단속을 연기할 수 없다고 했다. 매연여과장치가 언제 개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예'는 곧 과도한 오염 방출로 연결지었다. 다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5등급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어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그런데 노후차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의 대부분이 20년, 길게는 30년을 넘어 올드카 반열에 올라 일종의 '클래식'인데 무조건 폐차가 권고되니 섣불리 응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게다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관련 기업이 저감장치를 개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차는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목소리도 커진다. 나아가 이들은 운행 제한 확대가 한국의 클래식 자동차 문화를 없애는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유럽도 똑 같은 일을 겪었는데, 해법이 달랐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일찍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겪었다. 도심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할 때마다 오래된 차의 퇴출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반대 이유는 근대 산업 역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자동차라는 문화적 시각이었다. 산업 유물로서 자동차를 개인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오래됐다는 이유로 단순히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
그러자 결국 유럽 내 자동차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이태리 등이 도입한 묘수(?)는 연간 운행 거리 제한이다. 일정 기간 운행 후 노후될수록 배출가스가 많으니 시간의 흐름과 운행거리 제한을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새로 차를 사서 운행 거리 제한을 받지 않다가 10년이 지날 때부터 연간 운행 거리가 1만㎞로 제한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기간이 줄어 20년이 되면 법적 주행거리를 연간 2,000㎞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반면 운행 지역은 규제하지 않아 클래식카의 지역 간 거래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였고 클래식카 시장은 커져 관련 산업 및 시장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오래된 차의 부품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을 포함해 클래식카 복원, 그리고 미술품처럼 별도 경매 시장까지 활성화됐다.
 |
 |
그래서 한국도 오래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래될수록 운행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게 산업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자동차를 개인의 역사물로 여겨 오랜 시간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아버지가 처음 샀던 자동차를 아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50년 전 결혼 후 샀던 첫 차를 부부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폐차는 곧 추억을 없애라는 것과 같다. 나아가 IT 발전에 따라 운행거리 확인도 어렵지 않은 마당에 지금처럼 폐차 권유는 결코 능사가 아닌 만큼 제도적 정착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용(자동차칼럼니스트,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