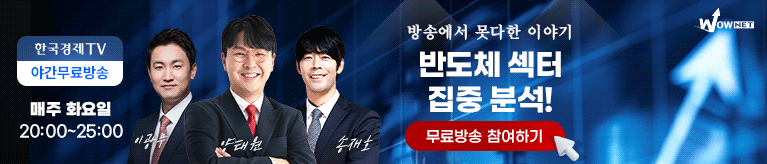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의 역할 및 기능은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지만, 경제학자 중에서도 문화예술 소비의 중요성을 연구한 이들이 있다. 런던정경대 교수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영국의 경제학자 앨런 피콕 경은 문화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그는 문화예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거쳐 피콕은 영국 산업통상부의 경제고문이자 국영방송인 BBC의 예산심사위원장을 맡아 영국의 문화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피콕은 문화예술산업의 특성과 소비 행태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금보다는 쿠폰 지급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의 공급자들도 결국 수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가장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기대되는 대도시에서 활동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공연이나 스포츠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방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피콕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 이들이 예술보다는 생활필수품 등 다른 용도에 지원금을 소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그는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예술보다는 식비 등 기타 필수 지출에 대한 소비 수요가 크기 때문에 용도가 한정돼 있는 쿠폰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콕을 비롯한 문화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영국은 물론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저소득층에게 연 9만원의 문화예술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이뤄지는 각종 공연 및 연극 할인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중심 지원 정책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