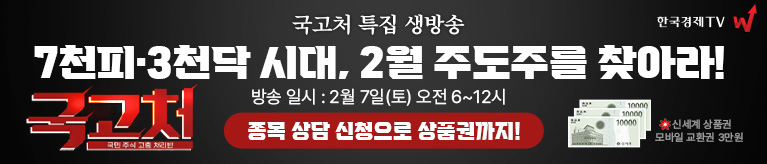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PEF가 돈을 벌려면 기업가치가 올라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험이 풍부한 PEF는 비합리적인 기존 경영자보다 투자도 많이 하고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인수합병(M&A) 담당 임원은 “요즘 국내에서 기업을 사고팔 때 PEF 없이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수천억원대 거래 절반 이상에 PEF
기업 경영권에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PEF는 2004년 12월 국내에서 처음 허용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바이아웃(경영권 매각) 펀드를 통해 국내 자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15년여 만에 이 시장은 급격히 커졌다. 경영참여형 PEF는 2018년 198개, 작년 206개에 이어 올해도 136개가 새로 생겼다. 해산한 펀드를 제외하고 지난 9월 말 기준 총 321개 운용사가 790개 펀드(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한 펀드 제외)를 운용하고 있다.올해 PEF가 매각 측이나 인수 측에 1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바이아웃 거래의 비중은 38.4%(올해 1~9월 151건 중 58건)에 달한다. 1000억원 이상 거래(37건)만 놓고 살피면 그 비중은 56.8%까지 높아진다. PEF가 끼지 않은 거래가 더 적을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이 9906억원에 기내식 및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건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PEF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상시적인 유동성 공급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간접 M&A’에도 활용
기업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SI)가 PEF에 돈을 대주는 형식으로 M&A에 간접 참여하기도 한다. 매그나칩반도체가 올초 파운드리 사업부 등을 매각한 알케미스트PE와 크레디언컨소시엄의 출자자로 SK그룹이 참여한 것이나, 두산솔루스를 인수한 스카이레이크에 롯데케미칼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이런 사례다. SI로서는 직접 인수로 인한 리스크를 덜 수 있고 PEF는 앵커(핵심) 투자자를 확보하고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진다.음식료 업종에선 ‘PEF 없이는 M&A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난다. 홍콩계 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미국계 KKR이 OB맥주를 샀다가 5년 만에 4조원 넘는 이익을 남기고 판 게 대표적이다. KFC와 할리스는 각각 CVC캐피털과 IMM PE를 거쳐 KG그룹에 안착했다. CJ가 운영하던 커피숍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앵커에쿼티가 사들였다. 유니슨캐피탈은 밀크티 프랜차이즈 공차를 인수했다가 미국계 PEF인 TA어소시에이츠에 매각했다.
중견 PEF인 큐캐피탈파트너스는 최근 700억원에 노랑통닭을 인수했다. 맘스터치(해마로푸드서비스)는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샀다. 미스터피자(MP그룹)는 최근 페리카나가 출자자로 참여한 TRI-얼머스투자조합1호에 매각됐다.
PEF 투자기업 성과도 좋아
PEF의 경영전략은 여러 가지다. 인수 후 강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다. 그러나 국내에선 대형 PEF들이 어려운 상황의 회사를 인수해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관련 기업을 인수해 결합시킴으로써 가치를 높이는(bolt-on) 전략을 쓰는 경우가 더 흔하다. 고용제도가 경직적이어서 일방적으로 직원을 내보내기가 어려운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또 PEF의 경영권 인수가 허용된 게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 해묵은 비효율적 관행을 제거하고 기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던 부분만 고쳐도 회사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펀드 만기가 길지 않은 경우 짧은 투자 기간(3~7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과 싸우며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가 없기도 하다.
PEF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성장성이나 고용 유지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다. 2005~2019년 PEF의 국내 투자 사례를 조사한 박용린 연구원에 따르면 PEF 투자를 받은 기업이 비슷한 기업과 비교해 투자 후 3년간 자산은 평균 16.2%, 매출은 14.2% 늘고, 부채비율은 평균 7.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