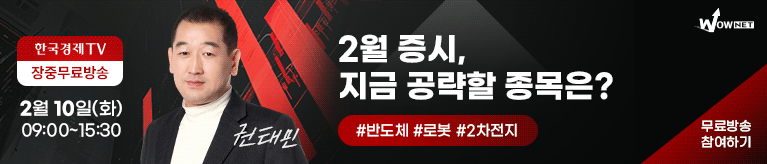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가득하다. 그중의 하나.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백악관 회고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가득하다. 그중의 하나.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정상회담을 겸한 만찬에서 시 주석은 “당신과 앞으로 6년 더 함께 일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아 있던 상황, 재선을 해야 가능한 6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연임까지로 제한한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를 미국 시민들이 원한다”고 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그해가 끝날 무렵 두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더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기록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불현듯 2016년 여름의 기억이 소환됐다. 4년 전 이맘때 미국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몇 달도 안 돼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던 그 전문가 집단을 향한 것이었다. 인터넷에는 ‘캐나다 이민’이 검색어로 부상하고 있을 때였다. “미국에는 시스템이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트럼프가 당선돼 보호무역, 반(反)이민, 동맹무시 정책을 추구해도 오랜 세월 토론, 선거, 입법 과정을 거쳐 세워 놓은 시스템이 미국적 가치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미국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무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을 무시했고, 회피했다. 수시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회를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스템 따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치워버릴 수 있는 벽돌쯤으로 치부된다. 이제 그는 ‘다시 4년’을 위해 미국 선거제를 무시할 요량이다.
이번 미국 대선을 결정 지을 변수는 우편투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편투표를 선호할 것이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공동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30%가 우편투표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지지 후보에 따라 현장투표 대 우편투표 성향이 빛과 그늘처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다수(66%)는 현장투표를, 조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거의 절반(47%)이 우편투표 의사를 밝혔다.
상황을 꼬이게 하는 것은 우편투표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하고 관장한다는 것이다. 우편투표 시스템은 주마다 백화제방식 차이점을 뽐낸다. 어떤 주는 투표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유효표로 계산하지만, 어떤 주는 투표 당일 검표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한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은 앞의 그룹에, 미시간, 위스콘신 등은 뒤의 그룹에 속한다. 후보 간 결정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주의 경우 우편투표 개표 과정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거의 내전상태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주류언론은 이번 선거가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연일 피를 토하는 글로 도배하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서는 4년 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민주당 성향의 흑인과 히스패닉의 투표가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 “민주당은 대선을 훔쳐가려 한다”며 우편투표의 정당성을 흠집 내는 데 혈안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다.
선거는 투표장에 지지자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경쟁이다. 경쟁은 과열되기 마련이고, 네거티브는 선거를 좌우하는 요술방망이처럼 돼버렸다. 난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것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들이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