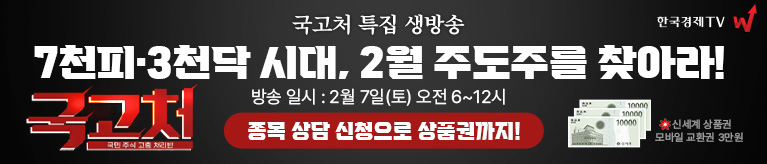부산시에 이어 서울시도 시장의 사고로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임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부시장이 시장 역할을 대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111조에 근거해서다. ‘임시 시장’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시장권한대행’이다.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도 시장의 사고로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후임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부시장이 시장 역할을 대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111조에 근거해서다. ‘임시 시장’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시장권한대행’이다.임시시장이 대행하는 것을 ‘권한’이라고 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부르도록 한 규정이 영 거슬린다. 말뜻이 석연치 않아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권한’을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풀이하고는 권능·권세·권리를 비슷한 말로 예시했다.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은 ‘시장이라는 자리는 권력과 권능, 권세를 휘두르는 곳’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에게는 당연히 권력이 필요하다. 일정한 영역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법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새겨야 할 게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 직(職)을 맡은 사람이 소임을 제대로 감당해내야 하므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붙여주는 게 권한이다. ‘직무’가 먼저고, ‘권한’은 나중이다.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권한을 주는 것이지, 권한을 휘두르라고 직무를 붙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권한’을 내세우지 않고도 주어진 책무를 완수해내는 성실하고 충직한 공직자가 적지 않다. 유권자 선택을 받아 직을 맡는 자리라면 ‘권한’에 앞서 ‘직무’를 강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치에 맞는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도하차한 배경을 짚어보면 ‘권한’을 강조해서는 안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 두 사람이 힘없는 여성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온갖 성추행을 저지른 데는 누구도 제동을 걸기 어려운 ‘제왕적 지위’가 작동했다는 게 많은 사람의 증언이다. 한 줌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고 비극적 종말을 자초한 자들의 후임에 붙이는 ‘권한대행’ 호칭은 더욱 괴상하다. ‘직무대행’으로 호칭을 바로잡는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기업들 세계에서는 ‘직무대행’만 있지, ‘권한대행’ 따위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더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게 있다. 대통령 유고(有故) 시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역시 ‘권한대행’으로 부르게 돼 있는 현실이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직무’보다 ‘권한’이 강조돼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 개선’이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각종 세금 인상과 대출규제 조치를 쏟아내는 데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고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유죄선고 받는 나라를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까지 각종 정치 현안을 언급하고는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던 터라 더욱 그렇다.
한 가지 더,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도 돌아볼 때가 됐다. 유럽 봉건왕정체제에서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새 나라를 세운 미국인들이 탄생시킨 게 대통령(president) 제도다. 민주적 국가지도자 개념으로 일군 ‘대통령’의 어원(語源)은 ‘회의를 주재한다’는 뜻의 ‘preside’다. 그런 명칭을 군국주의 시절 일본이 ‘크게(大) 거느리고(統) 다스리는(領) 사람’으로 번역한 게 그대로 수입돼 오늘에 이르렀다. 신지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의 제안처럼 ‘대한민국 대표’로 바꾸든지, ‘대통령’이란 표현을 재고할 때가 됐다. ‘친일잔재 청산’에 목청을 높이는 정부 아닌가.
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