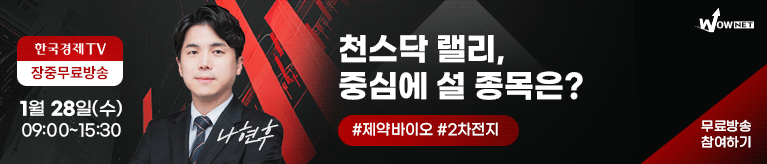‘지금 편하게 쓸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갈무리해 둘 것인가.’ 초저금리로 저축의 기본가치가 흔들리는 돈에만 국한된 딜레마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 찾기’는 인간사에서 영원한 과제다.
‘지금 편하게 쓸 것인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갈무리해 둘 것인가.’ 초저금리로 저축의 기본가치가 흔들리는 돈에만 국한된 딜레마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 찾기’는 인간사에서 영원한 과제다.그린벨트 해제 논란도 딱 그렇다.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원래 취지대로 미래용으로 둘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메리카 신대륙 이주자들이 첫 겨울 내내 굶주리면서도 봄에 뿌릴 씨앗만은 손대지 않았다거나, 대기근에도 씻나락은 지켰다는 우리 조상의 애절한 얘기도 있다. 하지만 풍요 속의 현대인은 참는 데 능하지 못하다. ‘평등해질수록 작은 불평등을 더 못 참는 게 사람’이란 말처럼 풍부해질수록 ‘작은 부족’을 못 견뎌 하는 게 현대인일지 모른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냉정하게 미래도 봐야…”라는 말이 먹혀들 것 같지도 않다.
결국 공급확대에 나선 정부·여당이 ‘수도권 허파’ 그린벨트 이용카드를 빼들었다. 경제부총리의 ‘해제 검토’ 발언 하루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부인했고, 여당이 나서면서 봉합되나 했더니 서울시가 ‘반대 발표’로 맞대응했다. 사공 많은 배처럼 오락가락, 중구난방이다. 그린벨트 도입 취지와 목적에 충실해온 서울시를 향해 ‘국토부 장관 직권해제설(說)’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권이 갑자기 몹시 다급한 모양이다. 어떻든 22번째 ‘7·10 대책’ 이후의 부동산대책은 여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그린벨트 문제는 더 그렇다.
1971년 처음 지정된 그린벨트는 어느덧 반세기 역사가 흘렀다. ‘재산권 침해와 도시의 보호·발전’, ‘현재 필요공간 확보와 미래세대 땅’ 등 무수한 논란 속에 조금씩 해제돼온 게 그린벨트다. 전에나, 지금이나 잘못 손대면 폭발하는 화약고이기도 하다. 해제 검토만으로도 후보지가 투기판처럼 된 적도 많다. 업무 담당자들의 공직소명감도 어떤 곳보다 높아야 할 분야다. 업무 보안도 생명이다.
다급한 여당은 서울시를 압박해서라도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분위기다. 결국 ‘어느 지역에 얼마나’가 관건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수단을 끝까지 강구해야 하고, 풀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도심 재개발이 먼저인지, 그린벨트 이용이 우선인지 거듭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번 풀면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미래세대 원망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보존하느냐, 지금 쓰느냐, 그린벨트 해제의 딜레마다. 이런 게 진짜 공론화거리 아닌가.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