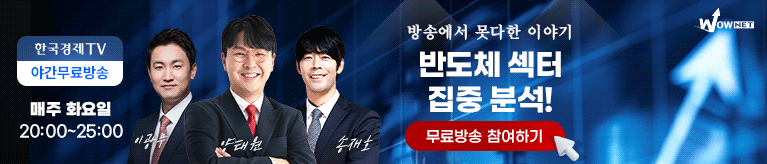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해온 도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교외 단독주택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 간 빈번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재택·유연근무도 정착하고 있어서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해온 도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교외 단독주택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 간 빈번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재택·유연근무도 정착하고 있어서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 단독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오토밸류에이션그룹이 지난 5월 뉴저지 주택 매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250만달러를 넘는 계약이 작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다.
제프리 오토 대표는 “뉴욕에서 300만달러짜리 집에 살다 외곽으로 나오면 똑같은 돈으로 3~4배 넓은 저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며 “이런 집에서 생활하면 당국이 봉쇄령을 내리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컨설팅업체는 교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엔 뉴저지주 집값이 올해보다 6% 뛸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이후 최대 폭이다.
뉴욕 중심부에서 약 20㎞ 떨어진 뉴저지주 몽클레어시의 수전 호로위츠 중개인은 “매물로 나온 집 한 채를 놓고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30% 뛰기도 했다”며 “갑자기 집값이 미친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뉴욕 맨해튼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이곳으로 이주한 미리앰 캔터는 “뉴욕에선 하루에 수차례 아파트를 드나들며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며 “예산보다 20% 더 들었지만 만족한다”고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미국 온라인 중개서비스인 레드핀에서 5월 한 달간 ‘단독주택’을 검색한 비중은 36%로, 작년 동기(28%)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글렌 캘먼 레드핀 최고경영자(CEO)는 “과거엔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도심 집값이 워낙 비싸 외곽으로 나가려는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자연 속에서 거주하려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질로의 매슈 스피크먼 이코노미스트는 “5월에만 미국 전체적으로 신규 단독주택 수요가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며 “이 트렌드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소비자 취향이 달라진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우편서비스의 등록 주소지 변경을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 이후 뉴욕에서 북부 코네티컷주 전원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 약 1만 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많은 수치다. 코네티컷주 내 웨스트포트시의 그린팜스사립학교는 올 3월 중순 이후 이달 초까지 65건의 신규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 동기엔 29건에 그쳤다. 뉴욕 주변의 단독주택 전문인 모니카 슈워버그 중개인은 “1년 중 가장 바쁜 4월에 보통 75건의 매매 상담을 하는데, 올해는 400건 이상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도심 지역 집값은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더글러스엘리먼의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급감했다. 맨해튼 아파트의 중간값은 작년 동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달러(약 12억원)에 머물렀다. 가격 하락폭은 2000년 이후 최대다.
다른 대도시도 다르지 않다. 올해 2~6월 맨체스터, 리버풀, 글래스고,에딘버러 등의 교외 주택 매매 및 임대 수요도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반면 런던 중심부의 주택 수요는 감소했다.
영국 부동산 포털인 주플라의 리처드 도널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후)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사 갈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