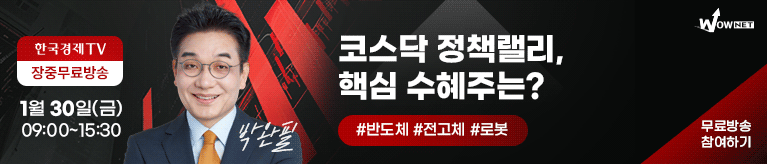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이른바 떼법 관행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주변 주민과 어린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해당 기업에 책임이 없거나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까지 들고나와 피해 보상 등의 떼를 쓰는 것은 대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법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떼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안이한 대처는 실망스럽다. 현행법엔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3회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강제 해산시킬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기업 앞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불법 설치된 현수막, 컨테이너 등도 관할 구청과 핑퐁을 하며 방치하는 게 다반사다.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든 반(反)기업 정서와 ‘기업은 강자, 시위대는 약자’라는 허구의 도식, 공권력의 눈치보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법치가 아니라 떼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이란 법치를 토대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여야 가능한 단계다. 이제 떼법이 아니라 법과 상식이 우리의 행동양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떼법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서라도 떼법 시위는 근절시켜야 한다. 떼법이 통하지 않고 손해가 된다는 선례가 쌓일 때 비로소 이런 나쁜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