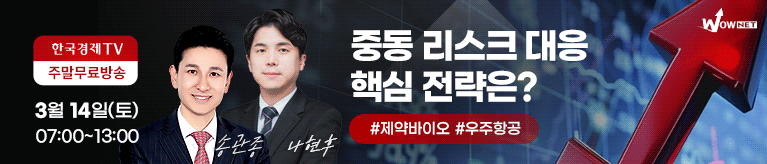올해 수정 요청 수용률 2.4%(915건)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과 2019년 수용률은 각각 28.1%, 21.5%로 올해보다 10배가량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은 53.0%로 절반 이상 수용됐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을 많이 내 수용률이 급락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집단민원 비율이 지난해 54%에서 올해 68%로 높아지긴 했지만, 수용률을 10분의 1 토막 낼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다.
게다가 공시가격이 시세의 80~90%에 달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행정 신뢰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부동산 값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공시가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시가 급등이 종부세율·재산세율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안팎 늘어나고 공시가와 시세의 역전이 임박한 아파트도 적지 않다. 주택 소유자가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집값이 일시 상승했다고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혹시라도 보유세 납세자 수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다중의 질시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면 징세라기보다 약탈에 가깝다. 굳이 보유세를 올리려면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도 동반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일 것이다.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정부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무리한 공시가를 고집하는 것도 방향착오다. 공시가 최종 확정(6월 26일)을 앞두고 한 달간 진행되는 마지막 이의신청 과정에 궤도에서 벗어난 세정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