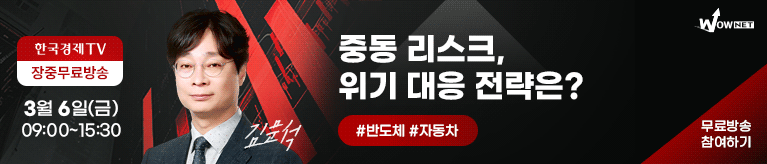미국 뉴욕에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주재원뿐 아니라 특파원은 대부분 맨해튼의 서쪽, 허드슨강 건너편인 뉴저지주(州)에 거주한다. 맨해튼은 방 두 개짜리 아파트 기준 월세가 5000~8000달러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 뉴욕에는 많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의 주재원뿐 아니라 특파원은 대부분 맨해튼의 서쪽, 허드슨강 건너편인 뉴저지주(州)에 거주한다. 맨해튼은 방 두 개짜리 아파트 기준 월세가 5000~8000달러에 달해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뉴저지도 그리 싸진 않다. 방 세 개짜리 싱글하우스(단독주택) 기준으로 월 3000달러 초중반이 최하다. 맨해튼에서 차로 40분쯤 걸리는 버겐카운티(county·시)의 기자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다. 호화 주택이라 그런 게 아니다. 1950년대 지어진 집이라 비가 오면 주방 쪽 지붕에선 물이 떨어진다. 비슷한 규모의 새집은 월세가 4000~5000달러로 뛴다.
각 지자체가 자율로 세율 결정
이 동네의 월세가 이처럼 높은 건 재산세(property tax), 즉 보유세가 비싸서다. 미국은 재산세가 주, 카운티, 버러(borough·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양지차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은 재산세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기자가 사는 동네의 한 해 재산세는 집값의 2.399%다. 기자가 거주하는 집의 감정가는 60만달러 수준으로, 집주인은 한 해 약 1만5000달러를 낸다. 그러니 월세를 덩달아 높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동네 주민들은 높은 재산세에 별 불만이 없다. 불만이 있으면 재산세가 낮은 주나 버러로 이사하면 된다. 인근에 재산세율이 0.7%인 동네도 있다.
굳이 이 버러에 살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건 그 돈이 동네를 위해 쓰인다는 걸 알아서다. 버러는 재산세를 거둬 동네 사람들이 가는 학교와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운영비로 쓴다. 그래서 재산세가 높은 버러의 학교가 통상 좋은 편이다. 치안과 복지,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학령기가 되면 일부러 옆 동네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보유세가 높아진 배경엔 지방자치가 자리잡고 있다. 이민자들은 동부를 일군 뒤 중부, 서부로 나아갔다. 그렇게 개척한 땅에 자체적으로 동네를 형성하고 살았다. 서부영화에서 보듯 스스로 보안관을 뽑아 동네를 지키고, 주민이 다닐 학교 등을 세웠다. 그리고 재산세를 거둬 이들 시설을 운영해온 것이다.
세금 지역에 쓰여 불만 적어
한국에선 보유세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가 (미국보다) 낮다’며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2%에서 4%로 높였다.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비율 역시 2년 전 80%에서 2022년 100%까지 올린다. 보유세 부담은 크게 커진다.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공시가 5억~9억원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5년 미만 보유)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 대비 30%가량 치솟는다.
보유세를 높이는 목적은 좋은 학교,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용도다. 사람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도 우리 집이나 동네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알 수 없다. 교육세, 주민세 등 미국에선 재산세에 포함된 세금도 따로 걷는다. 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중앙정부는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유세가 높아질수록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 높은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돼 월세가 미국처럼 급등할지 모른다.
모든 제도엔 역사적 배경과 연유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그 제도만을 도입하려 한다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