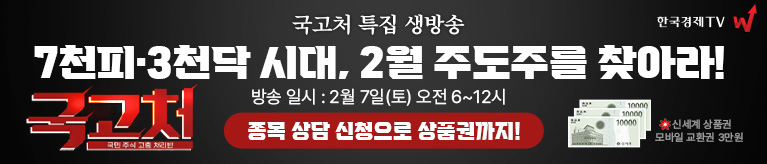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굉장히 멋진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고 싶어 10년간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은 한 번 정도 실패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멋진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고 싶어 10년간 준비했습니다. 대기업은 한 번 정도 실패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안 되잖아요.”김우택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회장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 1분기 미국과 남미, 유럽에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등 K콘텐츠만 24시간 나오는 스마트TV 방송 채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처음 공개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NEW는 영화 업계에서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와 더불어 ‘빅4’ 배급사로 통한다. 2016년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로도 유명하다.
NEW는 3년 전부터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투자·배급을 넘어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왔다.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보고 넷플릭스, 티빙 등 기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는 차별화된 디지털 방송채널을 선보이는 게 목표다.
신사업 투자에 몰두한 나머지 본업인 영화 사업이 부진을 겪기도 했다. 2014~2016년 시가총액 4000억원대를 웃돌던 회사는 1000억원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제 도전 과정에서의 삐거덕거림은 끝났다”며 “올해 각 사업부문이 모두 본궤도에 올라오는 동시에 이를 합친 1단계 퍼즐도 맞춰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포츠 등 8개 사업 확장
스포츠 등 8개 사업 확장김 회장은 첫 직장인 삼성물산 등을 거치면서 1990년대 대기업이 추진하던 영화 사업 인수합병(M&A) 업무를 맡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연이 닿았다. 30대에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와 쇼박스의 초대 대표를 맡았다. 그러다가 대기업을 떨치고 나와 2008년 NEW를 설립했다.
NEW는 2013년 대기업 3강을 제치고 영화 배급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부산행’ 등 1000만 관객 흥행 영화도 다수 배출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단순히 한국 영화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며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이젠 생존을 위한 길이 됐다”고 말했다.
2015년 스포츠사업 계열사인 브라보앤뉴를 시작으로 8개 사업 부문을 확장하면서 이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가기 시작했다. ‘영화사가 무슨 스포츠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김 회장의 미디어그룹 구상에 스포츠는 필수적이었다.
김 회장은 “스포츠는 음악과 함께 가장 파급력이 크지만 국내엔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골프, 당구, 스피드·피겨스케이팅, 컬링 등 스포츠콘텐츠의 유통·상품화뿐 아니라 선수 매니지먼트, 각종 대회 개최까지 모두 NEW의 사업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부문, 최근 340억원 투자 유치
2016년엔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앤뉴를 설립했다. 처음 제작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30%가 웃도는 시청률로 큰 인기를 끌며 대성공했다. 김 회장은 “미디어 플랫폼을 위해 제작까지 포함한 모든 과정을 직접 배우기 위해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후 ‘미스 함무라비’ ‘뷰티인사이드’ 등을 통해 제작 역량을 꾸준히 보여주며 올해도 다섯 작품이 대기 중이다.
스튜디오앤뉴는 최근 340여억원을 투자받았다. 비상장회사지만 기업가치는 843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코스닥에 상장한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의 시가총액 841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지난 3~4년 동안 본업인 영화에선 성적이 좋지 못했다. 김 회장은 “신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영화가 잘 버텨주길 바랐지만 개봉작들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반도(부산행2)’ 등 기대작이 개봉 예정이라 영화 성과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흑자전환도 확실시된다. NH투자증권은 NEW의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1943억원으로 예상했다.
NEW가 1분기 미국 등에서 선보일 K콘텐츠 방송 채널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 NEW는 직접 편성·송출하는 미디어를 갖게 된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영화 업계에선 드물게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20’에도 참석한다. 그는 “예전에는 칸 영화제를 가야 했지만 이제는 CES를 가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