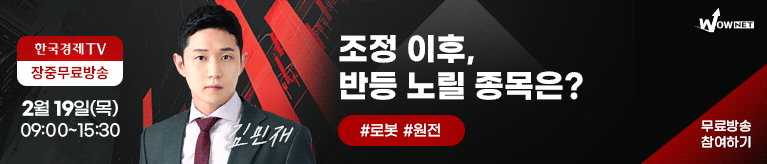국내 유일한 태양광 잉곳·웨이퍼 제조사인 웅진에너지가 대표적 사례다.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작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은 뒤 최근 공개매각에 들어갔다. 이달 인수의향서를 접수해 2월께 본격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잉곳과 웨이퍼는 태양전지(셀)의 핵심 자재다. 또 다른 잉곳·웨이퍼 제조사였던 넥솔론은 이미 2018년 파산했다.
2018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한국실리콘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 태양광 제조업 원재료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제조사 중 한국실리콘은 국내 2위 업체다. 1위인 OCI도 2018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작년 실적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업체들은 대대적인 설비 증설과 저가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내몽골지역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를 끌어 쓰는 데다 정부 지원을 받는 덕에 이런 가격정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소재 제조업체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준다. 태양광 소재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은 전체 생산원가의 30~4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 지원과 규모의 경제 덕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가파른 속도로 성장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8년까지의 10년간 중국의 풍력발전용량은 22배, 태양광발전용량은 700배 커졌다. 중국 태양광산업이 보조금 없이도 보급이 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중국국가기후변화전략연구 국제협력센터 리쥔펑 교수)이 나온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잇따라 위기에 내몰리자 풍력발전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설비의 제조국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0%였던 국내 풍력발전설비 중 국산 비중은 2018년 30%까지 떨어졌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