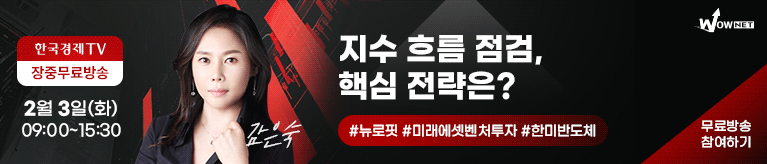경건하게 맞이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어수선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낸 ‘새로운 길’의 근본은 그 중간점이 ‘핵무력 완성’, 종착점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애초부터 그의 안중에 핵 포기는 없었다. 대북제재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 요구는 ‘본래의 길’을 굳히려는 눈가림이었다. 실제로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산인 ‘조선반도 평화보장’(1954년)과 ‘조국통일 5대 강령’(1973년)을 공세적으로 세습하고 있다.
경건하게 맞이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어수선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낸 ‘새로운 길’의 근본은 그 중간점이 ‘핵무력 완성’, 종착점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애초부터 그의 안중에 핵 포기는 없었다. 대북제재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 요구는 ‘본래의 길’을 굳히려는 눈가림이었다. 실제로 김정은은 김일성의 유산인 ‘조선반도 평화보장’(1954년)과 ‘조국통일 5대 강령’(1973년)을 공세적으로 세습하고 있다.지난 2년여 동안 한·미 양국이 공들였던 북한 비핵화 대화는 표류 중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판정승이다. 북한은 핵 무장 동기를 미국 위협으로부터 자위하는 데 있다고 억지 주장해왔다. 북한의 교활한 선전술이 먹힌 탓인지 우리 사회의 동조론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이런 성과에 고무된 김정은은 자신만의 ‘전략적 게임플랜’을 거침없이 몰아붙일 기세다.
김정은은 선대의 퍼포먼스를 이미 뛰어넘었다. 오로지 핵 능력 덕분이다. 김정은은 ‘세계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세 번이나 마주 앉았고 친서를 주고받는 관계다.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연계해 한·미 연습훈련 영구 중단을 주장한다. 그 본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다.
김정은은 ‘위계적’ 남북관계를 강요하며 버젓이 ‘전체 조선민족의 최고지도자’로 행세한다. 그러니 틈만 나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한다. 통일전선·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 차원에서 순수 민간교류는 거부하고 ‘전(全)민족대회’를 요구하면서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로 한·미 동맹을 협박하는 것은 당위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도 정부는 굴종적이고 국민은 태평하다.
지금의 유화적 정책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행보는 한·미 동맹의 통제범위에서 점점 더 벗어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1935년 영국 의회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던 때는 방치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떤 해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살려 우리 정부는 모호한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 협상의 창을 열어두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 봐야 쓸모없고 더 곤궁하고 불안정해진다”고 인식토록 외교·군사적 압박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된다.
새해에는 한·미 ‘핵동맹’과 그 출발점인 ‘핵공유협정’이 우리 사회의 담론이어야 한다. 현행 낮은 수준의 ‘핵공유체제’를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핵운용계획·준비·실행을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는 조치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까지 미국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로 ‘전략적 균형’을 이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압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초부터 핵사용 옵션을 늘리는 중이다. 전술폭격기용 미사일(B61-12), 잠수함용 미사일(W76-2/W-84) 등 신예 핵전력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 이런 선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1979년 12월 채택했던 ‘이중결정’과 비견되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이 될 것이다.
새해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 정부 공히 비핵화 대화를 ‘그럭저럭 끌고 가기’만 해도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만을 위협으로 간주해 나쁜 거래인 ‘스몰딜’을 성사시킨다면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것이다. 더욱이 미·북 간 ‘노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남북도로·철도사업 등 경제·문화 협력을 선행할 경우엔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전환기를 맞이한 한·미 동맹체제의 균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가리더십은 낭만적 대북관을 버려야 하며, 자신들이 추구한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