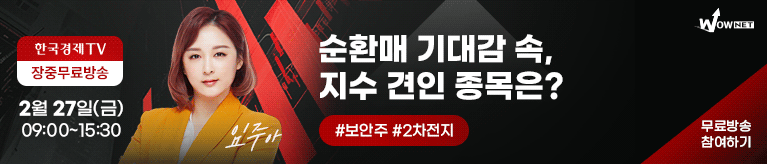서양화가 정일 경인교대 교수(61)는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천둥처럼 그의 영혼을 강타했던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내버려진 그에게 소설은 커다란 위안이었다. 삶이 고단하거나 열정이 고갈될 때마다 작업실 구석에서 슬그머니 책을 꺼내 읽으며 사색과 명상, 엄격한 자기수련의 지혜를 배웠다. 솔깃하게 와닿는 문장들을 때로는 유쾌하고 정답게, 때로는 심각하고 엄숙하게 그림으로 승화했다. 한국적 초현실주의 미술에 도전장을 던지며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환희를 눈부신 색채로 화면에 쏟아냈다. 2009년에는 그의 작품이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가 암투병하면서 쓴 에세이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표지에 실려 화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정 교수가 12년 만에 소설 속 어린 왕자처럼 동화적이고 몽환적 작품을 들고 겨울 화단에 돌아왔다. 오는 31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리는 개인전 ‘레미니스(Reminisce·추억)’에 ‘어린 왕자’에서 큰 영감을 받아 내면적 경험과 감정을 몽환적인 색채로 풀어낸 회화 작품 40여 점을 걸었다. “예술가는 정신연령이 10세 미만이어야 한다”며 “작품을 보면서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작가의 말이 백설기처럼 순박하다.
정 교수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국내는 물론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80여 차례 전시를 열었다. 미술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평생 붓을 놓은 적이 없으니 그림과 동행한 40년의 세월이 무르익었다. 그는 “과거와 미래의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다시금 지나온 나의 이야기를 되감아 봤다”며 “회갑의 나이에 다시 떠올려보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라고 했다.
전시장에는 그만의 초현실적 화법으로 한껏 쌓아 올린 행복의 꿈틀거림이 날것으로 다가온다. 두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 축복을 밝혀주는 촛불, 청순한 여인의 눈빛 등은 살아있는 것 같은 원초적 미감을 분출한다. 이전 작품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한 여왕의 등장도 눈에 띈다. 17세기 프랑스 여인들이 착용했던 드레스와 부채, 회전목마를 모티브로 활용해 자신의 아내를 여왕으로 꾸몄다. 작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를 귀한 존재로 묘사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며 슬며시 웃었다.
그의 그림에는 행복을 평생 화폭에 붙들어 매겠다는 몸부림 같은 게 묻어 있다. 편안한 안식의 공간에 사랑과 희망을 살짝 얹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살려내고, 몽환적 색채로 자신의 감수성을 우회적으로 아울렀다. 피아노, 바이올린, 꽃, 새, 촛불, 우산, 의자, 테이블 등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화면 곳곳에 배치해 행복을 문학적 서사로 풀어냈다. 낭만적인 글귀와 음표를 가끔 그려 넣어 오돌토돌한 질감에 리듬감도 실었다. 작가는 “극도로 빨라진 정보화와 인간성 상실에 따른 현대인의 불안감을 그림으로 치유하고 싶었다”며 “유행처럼 주류를 형성하는 미학 언어나 특정한 논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유한 양식의 행복을 그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영원한 창작 에너지는 동심”이라는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꿈과 희망에서 기운을 받아 ‘60대 어린 왕자’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