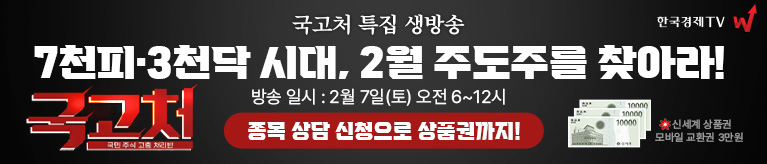발단은 전국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이다. 한전산업 정규직인 연료·환경담당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에선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작년 말 서부발전 협력사(한국발전기술)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전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전산업 등 인력파견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그 중심엔 올 상반기 구성된 ‘발전산업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을 발전사들이 직고용하거나 자회사 정규직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전산업 관계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2를 빼내 발전 공기업 정규직으로 만들면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은 아예 소멸할 것”이라며 “멀쩡한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도산 위기로 모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더구나 한전산업은 외국인 주주가 적지 않은 상장회사다. 1990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출발해 2003년 민영화됐다. 대주주는 한국자유총연맹(31%) 및 한전(29%)이다. 전국 발전소의 인력파견 점유율이 77%에 달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높다.
위기감이 팽배해진 한전산업은 최근 홍원의 사장 명의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홍 사장은 공문에서 “(발전사들이 한전산업 정규직을 대규모로 빼갈 경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기업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 소송, 외국인 주주의 차별 문제, 소액주주 민원, 간접인력 실업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 발전 공기업이 한전산업 정규직을 별도 자회사로 흡수할 경우 입찰경쟁의 유효성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들이 지금과 같은 경쟁입찰 대신 새 자회사와 연료·환경 관련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전산업 관계자는 “한전산업 인력을 발전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안전이 강화되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