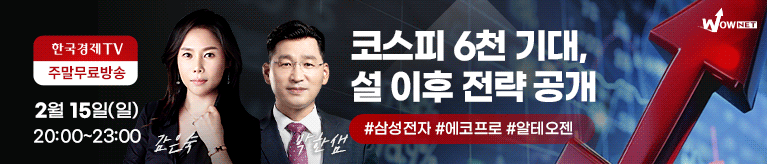현행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20만91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책을 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이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이전에도 빈번했지만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이번 청원 글은 출판·서점계가 현행 제도의 개정 방향으로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 중인 것을 알리고 공론화시키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한 달간 20만91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책을 팔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이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이전에도 빈번했지만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이번 청원 글은 출판·서점계가 현행 제도의 개정 방향으로 ‘완전 도서정가제’를 추진 중인 것을 알리고 공론화시키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정가제 폐지' 청원, 20만 명 넘어
완전 도서정가제는 새로울 게 없다. 도서정가제가 법으로 처음 시행된 2003년 이후 개정 논의 때마다 등장한 주장이다. 국내에서 팔리는 책에는 두 개의 가격만 있다. 책 정가대로 파는 오프라인 서점 가격과 이보다 10% 싼 온라인 서점 가격이다. 그 사이 중간 가격은 없다.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도서정가제를 처음 법제화할 때 온라인 서점에만 ‘최대 10% 할인’을 허용해서 그렇게 됐다.
완전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정가’를 없애고 오프라인 가격만 판매가로 남겨 놓자는 것이다. 유통구조상 오프라인보다 싸게 팔 여력이 있는 온라인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온라인 업체들이 받아들일 리 없고,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도 불 보듯 뻔하다.
출판·서점계 의견이 대폭 수용된 5년 전 개정 때도 ‘10% 할인’을 손보지 못했다. 마일리지 적립폭만 정가의 9%에서 5%로 줄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당시 개정안, 즉 현행 도서정가제는 ‘단통법’에 비유되며 많은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 가격 규제가 들어 있어서였다. 발행한 지 18개월 이상 지난 ‘구간(舊刊)’에도 정가제를 적용한 것이다. 구간의 할인 판매 경쟁이 출판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이유였다.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운영하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발행 후 18개월이나 2년이 지난 책에는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간만이 아니다. 실용서, 전집 등 종류와 형태를 불문한 모든 책, 심지어 제작·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난 ‘리퍼 도서’에도 정가제를 적용했다. 그 결과 출판사 창고세일, 책축제 기획전 등 온갖 할인 마케팅은 자취를 감췄다. 가격 통제면에선 이미 완전한 도서정가제다. 그런데 제도 취지대로 출판문화 생태계는 좋아졌을까. 그동안 중소서점은 계속 줄어들고, 독서율은 떨어지고, 평균 발행부수는 줄었다. 이런 추세는 그전부터 시작됐고 세계적인 현상이니 인과관계를 규명하긴 어렵다. 하지만 할인 마케팅의 원천 차단으로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독서 인구의 일부가 이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유례없는 '舊刊 가격제한' 풀어야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업형 중고서점의 급성장이다. 할인 마케팅을 못하게 된 온라인 서점들이 책을 싸게 보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알라딘의 중고서점 매장 수는 45개로 교보문고(36개)와 영풍문고(43개)보다 많다. 요즘 조성되는 복합상업시설에는 대형 서점보다 중고책 매장이 들어선다.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2020년 개정 논의가 출판·서점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규제가 완전해지면 시장과 소비자는 숨이 막힌다. 이번에는 그동안 ‘없는 규제’를 만들어온 개정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 ‘있는 규제’를 없애야 도서 생태계가 살아난다. 구간의 가격 제한을 푸는 게 출발점이다.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