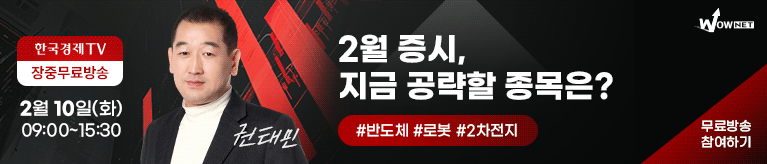1960년대 팝아트는 세계 미술의 큰 물결을 주도했다. 대중문화와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한 팝아트는 대중에게는 달콤한 색채와 눈에 익은 이미지로 다가왔다. 미국 화가 리처드 페티본은 ‘팝아트의 복제’라는 또 다른 화두를 던지며 국제 화단에 돌풍을 일으켰다. 1962년 앤디 워홀의 개인전에서 팝아트를 처음 접한 페티본은 유명 배우나 가수 등 당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차용한 워홀의 작품을 작은 포켓 크기로 복제하기 시작했다. ‘차용과 복제’에서 더 나아간 ‘재차용과 재복제’를 통해 예술품은 유일무이한 원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1960년대 팝아트는 세계 미술의 큰 물결을 주도했다. 대중문화와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한 팝아트는 대중에게는 달콤한 색채와 눈에 익은 이미지로 다가왔다. 미국 화가 리처드 페티본은 ‘팝아트의 복제’라는 또 다른 화두를 던지며 국제 화단에 돌풍을 일으켰다. 1962년 앤디 워홀의 개인전에서 팝아트를 처음 접한 페티본은 유명 배우나 가수 등 당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차용한 워홀의 작품을 작은 포켓 크기로 복제하기 시작했다. ‘차용과 복제’에서 더 나아간 ‘재차용과 재복제’를 통해 예술품은 유일무이한 원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과감하게 보여줬다.1965년에 완성한 ‘앤디 워홀, 플라워즈’도 앤디 워홀의 대표작 ‘플라워즈’ 시리즈를 차용해 가로와 세로 길이가 16㎝ 남짓한 작은 캔버스 위에 절제된 형태로 묘사한 작품이다. 원래 작품은 네 송이 꽃만을 잡아냈지만 이를 검은 바탕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되살려 16개의 배열판으로 재구성했다. 제작 공정도 잉크가 스크린의 망점을 통과해 인쇄되는 유일날염법(唯一捺染法)을 사용했다. 워홀의 작품에 담긴 개념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게 하며 현대 사회에 내재한 소품종 대량생산의 가치를 보여준다.
김경갑 기자 kkk1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