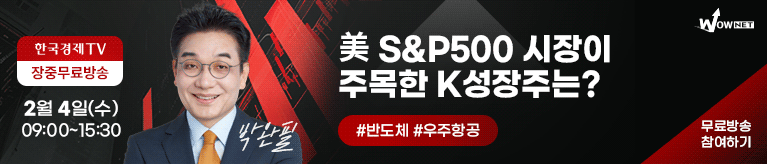"언제까지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목 놓아 기다릴 것인가? 기다리다 지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시장을 키우고 싶은 기업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낫다." 지난 10월 프랑스 파리모터쇼에서 만난 독일자동차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EV 시장을 장악하려면 EV에 규격화 된 고속 충전 인프라를 먼저 늘리는 게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테슬라다. 테슬라는 '슈퍼차저'라 불리는 자신들만의 고속 충전기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장거리 EV를 이용할 때 충전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고속 충전이 가능한 테슬라 EV를 구입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충전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다. 제 아무리 EV에 기업 생존이 걸렸어도 값 비싼 고속 충전기를 단 기간에 확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더딘 설치는 EV의 구매 장벽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
그런데 고속 충전기를 여러 자동차회사가 손잡고 공동으로 구축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EV는 각자 개발, 판매하되 충전기를 함께 설치하면 그만큼 공동 전선이 구축되고, EV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지배력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뭉친 기업은 일종의 EV 연합군이어서 새로 진입하는 EV 경쟁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도 유리하다.
실제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유럽 내 포드와 다임러그룹, BMW그룹, 폭스바겐그룹이 고속 충전기 공동 구축에 합의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4사의 제품만 이용 가능한 초고속 EV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10억 유로(한화 1조2,500억원)를 투자해 2017년 400기의 고속 충전기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수천 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전체를 하나의 도로망으로 볼 때 곳곳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소비자의 '전기차 주행거리 두려움(Range anxiety)'을 허물 수 있고, 이를 기회삼아 EV 시장을 키우면 결국 지배자가 된다는 논리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4사가 세우려는 고속 충전기의 성능이다. 이들은 통합충전시스템(CCS) 기반의 최대 350㎾h 출력이 가능한 고전압 충전기를 선택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충전을 자랑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3배나 성능이 뛰어나다. 테슬라가 완전충전에 3시간이 걸릴 때 4사 EV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주행거리 불안감을 제거하려면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이때 단점으로 나타나는 장시간 충전을 고전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설치 후 충전 성능을 손쉽게 높이는 방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내연기관으로 비유하면 멀리 가기 위해 연료통을 키우고, 기름 채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유기 노즐의 분사압력을 높이는 식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4사의 공동 전선 구축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모두 독일에 둥지가 있다는 점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기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 온 독일로선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전기(電氣)'로 변모하자 사용자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장악력을 잃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제 아무리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아도 주유소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듯 EV가 많아도 충전기가 부족하면 소비자가 외면하고, 충전기가 많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EV를 만들어봐야 재고만 쌓일 게 분명해서다. 따라서 4사의 고속 충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두 가지 장애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그리고 독일 4사가 손을 맞잡은 또 하나의 이유는 프랑스의 견제다. 독일차 컨소시엄 주도로 유럽 대륙 곳곳에 고속 충전기가 도입되면 이들과 충전방식이 다른 프랑스 르노의 EV는 불리함을 겪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일 생산 EV는 유럽 대륙 이동에 불편함이 없지만 프랑스산 EV는 프랑스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충전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경우 유럽 소비자들은 독일산 EV를 선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EV 시장도 독일이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CCS 충전 방식은 미국도 사용하는 것이어서 미국에 독일 EV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내연기관과 달리 미래 EV 시장을 선점하려면 자체 고속 충전 인프라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로 시선이 모아진다. 국민들 눈치를 보아가며 세금을 써야 하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드는 게 더 빠르다는 뜻이다.
 |
현재 한국은 여전히 환경부 주도의 충전기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제조사가 EV 구매자에게 개별 설치해주고, 자체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만 바라보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좀처럼 EV 시장이 커지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도 유럽처럼 제조사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 충전망 구축에 나서면 어떨까 한다. 시장을 함께 키우고 그 속에서 개별 제품 간의 경쟁이 펼쳐지는 것 말이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 [칼럼]중국의 자동차 굴기
▶ [칼럼]춘추전국시대 열리는 한국 자동차시장
▶ [칼럼]자동차, 중국이 싫으면 그냥 나가라
▶ [칼럼]AVN 1위 통째로 삼킨 삼성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