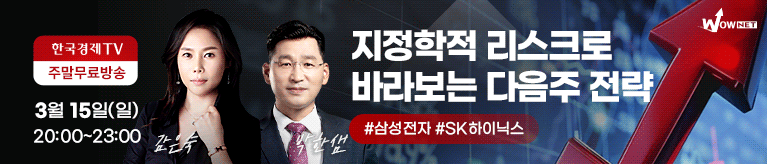포드와 구글이 마침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다. 포드의 자동차 하드웨어에 구글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자율주행에서 한발 앞서 가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번 결합을 성사시킨 인물은 다름 아닌 포드 출신의 앨런 멀랠리 구글 이사회 멤버와 현대차 미국법인 CEO였던 존 그라프칙 구글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장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 자동차회사에 몸담았던 경험을 앞세워 구글의 독자적 행보만으로는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 포드와 협업을 이끌어 냈다. 한 마디로 포드가 만든 심장(전기모터 및 엔진)과 몸(차체)에 구글의 머리(소프트웨어)를 얹는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차 분야를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
한 때 자동차에 맞설 것으로 전망됐던 IT가 전통의 자동차회사와 손잡은 이유는 명확하다. 관련 기술의 적용 분야로 자동차만큼 방대한 시장이 없어서다. 물론 로봇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전통적 개념에서 로봇산업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업 분야를 확보해야 하는 IT기업으로선 자동차만큼 매력적인 분야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산업분야의 융합이다. 자동차와 IT가 접목되면서 양산업의 밀접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휴대전화를 만들었던 기업이라면 휴대전화에 지능을 심어 자동차에 부품처럼 넣으면 또 하나의 단말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더불어 휴대전화가 다양한 정보를 모아주는 커넥티드 역할이라면 반드시 통신이 필요하고, 이 때 통신사는 모든 자동차가 휴대전화로 보일 수밖에 없다.
 |
실제 이런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휴대전화와 자동차 센터페시어 모니터를 연결하는 미러링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이며, IT 기업의 지도 서비스를 자동차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다. 요즘 화두처럼 떠오르는 '자율주행'이 생활 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얘기다. 쉽게 보면 자율주행이 다가올 미래에 완성될 것처럼 소란스럽지만 자율주행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등장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간다는 뜻이다. 인간의 순간 판단력에 버금가는 지능 개발 노력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변화의 속도다. 자율주행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지금의 추세라면 2030년이면 자율주행이 아니라 모든 기계가 '자율'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끝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도 적지 않다. 자동차 또한 스스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활용하는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시작됐으니 말이다.
조용히 한 해를 마감해야 할 때 먼 미래를 생각해 본 건 최근 부분적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시승한 이후부터다. 자율주행, 아니 자율기계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너무나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해본다. "그들은 이미 왔다,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권용주 선임기자 soo4195@autotimes.co.kr
▶ [칼럼]친환경차, 보조금보다 매력적인 구매요소가 있다면
▶ [칼럼]삼성전자의 기습(?), 현대차 긴장하나
▶ [칼럼]탄소 배출을 바라보는 정부의 두 얼굴
▶ [칼럼]폭스바겐의 377% 성장이 말하는 것은
▶ [칼럼]핵심은 경쟁, 숫자를 보면 시장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