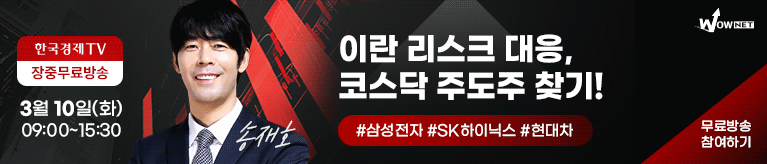[김성률 기자] 도봉산 자운봉 '배추흰나비의 추억' 리지(암릉/ridge)로 걸어가면서 "도대체 이 바윗길에는 왜 '배추흰나비길' 이름이 붙었을까"하는 의문으로 자일 파트너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풍문으로 알고 있는 ‘배추흰나비의 추억길’의 작명사유는 이랬다. 첫 번째는 배추흰나비의 추억길을 등반하려면 총 6피치 중 4피치에 배추흰나비 애벌레 같이 꼬물꼬물 올라가는 길이 있다하여 애벌레가 자라나면 배추흰나비가 되기 때문에 ‘배추흰나비의 추억’이 되었다는 설이다. 참 그럴 듯한 해석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배추흰나비길이 리지길이라기 보다는 그냥 바윗길로 봐야할 정도로 만만치 않게 어려운 편인데 이 바윗길을 등반하면 비로소 애벌레의 단계가 지나 흰나비로 탈바꿈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길의 개척자가 바윗길을 내고 있는데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순간 배추흰나비가 날아갔고 그 나비를 본 개척자가 아무 생각없이(?) '배추흰나비의 추억'이라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글쎄 ‘배추흰나비의 추억길’ 개척자가 이렇게 심오하거나 즉흥적인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스토리를 들어도 일리가 있어 보였다.
과연 ‘배추흰나비의 추억길’은 어떤 사유로 붙여진 이름일까? 정답은 이 기사를 읽다보면 자연히 해결된다.
배추흰나비의 추억 길은 어프로치가 다소 긴 편으로 천천히 도봉산 입구에서 천천히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만월암 이정표를 보고 계속 오르다가 만월암을 지나쳐 큰 마당바위에서 희미한 소로길을 따라 올라야 한다.
첫째 마디에서 기자는 잠깐 갈등을 했다. 이 정도 난이도라면 그냥 리지화를 신고 등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암벽화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리지화를 신고 등반을 시작했다.

첫째 마디는 몸을 푸는 구간 정도로 거리 40미터, 난이도 5.6의 좌향크랙길이다. 레이백 기술을 사용하면 홀드가 양호해서 출발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거리는 40미터로 꽤 먼 편이다. 둘째 마디 역시 26미터의 크랙구간이다. 우측으로 왕관처럼 튀어 나온 바위를 잡고 천천히 오르다보면 상계동으로 툭 트여진 전망이 등반자를 기다린다. 둘째 마디를 오르면 5미터의 짧은 하강을 하게 된다.
첫째 마디에 등반자가 밀려있으면 대개 이곳으로 와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팀의 속도가 보통 이하라면 순서를 기다려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마디부터 미련하게 등반한 팀이 이곳에서 늦게 온 팀에 밀려 기다리며 등반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기자가 등반할 때도 뒤 팀 약 8명이 새치기를 했는데 다행히 양보를 받아 넷째 마디부터는 앞서서 등반할 수 있었다.
셋째 마디는 일별하기에 바짝 서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다시 한 개의 큰 바위가 얹혀져 있는 형국이다. 거리가 약 30미터로 벙어리 크랙과 직상 크랙을 지나게 된다. 벙어리 크랙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크랙이 넓기 때문에 초보자가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두 손의 밀고 당김을 적절히 하고 발끝에 힘을 주어 힘 있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마디 상단 부분은 바위가 딱 서있어 출발과 마무리가 쉽지만은 않은 구간이다. 셋째 마디는 난이도 5.10 정도가 된다.
셋째 마디를 앞두고 아무래도 암벽화를 신어야 할 것 같아 배낭을 열어보았더니 분명히 배낭 속에 들어있던 암벽화가 보이지를 않는다. 차분히 생각해보니 첫째 마디에서 암벽화를 신을까 리지화를 신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곳에 두고 온 것이었다. 맨발로 갈 수가 없으니 그냥 리지화를 신고 마무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지만 실망스럽게도 여러 번 반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마디는 거리 10미터로 바위띠(밴드)를 타고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반침니 안으로 약 5미터 정도를 오른다. 애벌레가 되는 순간이다. 배추흰나비는 이 길을 가는 등반자를 애벌레로 착각하고 튀어나왔을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붙어보면 만만치가 않다. 난이도는 5.9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다섯째 마디는 난이도 5.10, 거리 25미터의 크랙구간이다. 크랙 사이에 짧은 슬랩이 있는데 각도가 세기 때문에 선등 빌레이도 타이트하게 보아야 한다. 이 구간 중간 부분에 움직이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조심스럽게 밟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는데 손으로 잡아당기면 낙석의 위험이 있다. 흔들거리는 이 바위 그동안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 언젠가는 떨어질 것만 같아 보인다.
다섯째 마디와 여섯째 마디 사이에 좌측으로 탈출로가 있으니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이곳으로 탈출하면 된다. 여섯째 마디는 거리 25미터의 언더크랙. 마지막 10미터 거리의 일곱째 마디를 오르면 이곳이 바로 연기봉이다. 이곳에서 약 10미터의 바위 사면을 하강하면 실질적인 등반이 끝이 난다. 이곳에서 다시 우측으로 가면 거의 수직으로 서있는 10미터의 벽이 나오는데 이 벽을 크랙을 따라 오르게 되면 자운봉 정상과 만나게 된다.
배추흰나비의 추억길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거침없는 경치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것이 눈을 즐겁게 한다. 왼쪽으로는 역시 리지길인 낭만길과 그 길을 등반하는 클라이머들이 아스라이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워킹 산행하는 이들의 대화가 아스라히 들려온다.

참, 배추흰나비길의 추억길 개척자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기자는 몇 해 전 월간 산에서 읽었던 기사를 망각하고 있었다. 낯익은 이름 세 글자는 김기섭.
김기섭 씨는 시인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바윗길을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클라이머이다. 경원대 국문과 출신의 기섭 씨는 아름다운 길도 많이 개척했지만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우리말 바윗길 이름을 붙여 산악인의 정서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인물이다.
대학 1학년 때 설악산 권금성을 오르던 그는 피라미드를 닮은 노적봉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하게 되었다. 산악인들에게 이런 경험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노적봉에 대한 김기섭의 연모는 6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된다. 1988년 여름에 노적봉을 오르다가 새로운 등반선을 찾아낸 것이었다.
다음해 새로운 등반선을 따라 등반하던 그는 에델바이스가 지천에 깔리고 거대한 토왕폭이 물기둥을 쏟아내며 달마봉에서는 쌍무지개가 떠오르는 환상적인 장면과 조우하게 된다.
김기섭은 그 길에 '한 편의 시를 위한 길'이라 이름 짓고 봉헌시까지 지었다.
김기섭 씨는 이후에도 ‘신동엽길’(93년), ‘녹두장군길’(94년), ‘김개남장군길’(94년)을 개척했고 노적봉에 ‘경원대길’(96년)과 도봉산 자운봉에 ‘배추흰나비의 추억‘(98년), 설악산 토왕골 경원대리지(96년)와 ’별을 따는 소년들‘(97년), 설악산 망경대 별길(99년)과 석황사골 몽유도원도(01년) 등을 개척했다.
그렇다면 배추흰나비의 추억이란 길은 어떻게 붙여진 이름일까? ‘배추흰나비의 추억’은 김기섭 씨가 개척 당시 산에서 보기 힘든 배추흰나비가 날아들었기에 추억이란 단어를 붙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김기섭 씨는 2006년 11월 코오롱등산학교 강사로 등반중 사고를 당해 오랜 재활훈련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독신으로 아름다운 바윗길을 여럿 낸 그의 부상은 많은 산악인들을 슬프게 했으며 모금운동도 펼쳐졌다.
그와 함께 등반을 했던 산악인들은 김기섭 씨를 작은 키이지만 당찼고 암장과 암벽에서는 나비처럼 바위를 탔던 바윗꾼이자 두주불사의 주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섬세한 면을 지니고 있던 시인이라고 추억한다. 기자는 김기섭 씨의 최근 근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아마도 예전에 못다 마친 바윗길의 개척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배추흰나비의 추억'을 위한 시는 없기에 이 땅에 아름다운 바윗길 이름들을 지어 준 김기섭 님을 생각하며 그의 시 '한편의 시를 위한 길'을 소개해 본다.
암벽화 끈을 조이며
이마에 붉은 스카프를 묶는다.
피너클 아래 까마득한
소토왕골의
시퍼런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동해 푸른 바다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우리가 처음인지도 모른다.
중략
우리는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치 못할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를 보았다.
그리고
푸른 바다
동해가 밀려들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리꽂는
저 까마득한 수직의 물줄기
우리가 구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바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태어난 처음 비밀처럼 깨달았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kimgmp@bntnews.co.kr
▶한국의 바위길을 가다(1) 인수봉 동양길 / 클라이머가 행복해지는 변주곡
▶한국의 바위길을 가다(9) 설악산 천화대 / 하늘에 핀 꽃 설악을 물들이다
▶한국의 바윗길을 가다(10) 인수봉 빌라길 / 명품길로 인정받는 인수의 지존
▶[김성률의 히말라야 다이어리 ①] 안나푸르나를 향하여
▶[김성률의 에베레스트 다이어리 ①] 가자! 에베레스트를 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