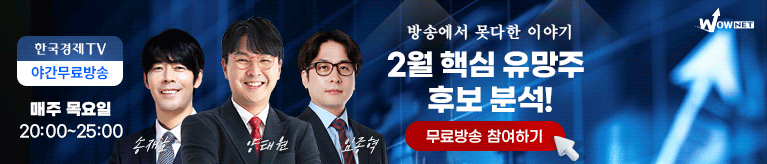◆공간을 판다
첫째는 ‘땅을 판다’는 점이다. 온라인이니까 무한한 공간을 열어둔다는 개념을 가질 법도 하고, 실제로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무한한 영역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도 있다. 그렇지만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고 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편이 수익화에 유리하다.
롯데그룹 계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롯데정보통신이 인수해 키우고 있는 칼리버스나 게임회사 컴투스의 컴투버스는 메타버스 내 부지를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칼리버스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땅과 빌딩을 판매한다. 소형·중형·대형·초대형 네 가지 크기를 상업적 용도와 비상업적 용도로 나눠서 파는데, 소형 빌딩은 250~400㎡, 초대형 빌딩은 6400~7056㎡다. 소형은 인스턴스 룸을 2개까지, 엑스트라 라지는 20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컴투스의 컴투버스도 이와 비슷한 콘셉트다. 총 9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버전인 첫 번째 섬은 종로구 크기(약 24㎢)로 설정됐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에선 가상공간에 대한 최적의 설계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이 메타버스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제트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미글루’ 역시 유한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가로 2㎞, 세로 2㎞가량으로 300~500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여러 채널로 만들 예정이다.
◆B2B가 주력
둘째는 기업고객을 주로 상대한다는 것이다. 개인도 메타버스 속 땅과 빌딩을 살 수 있지만 주요 타깃은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대규모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상대로 기업 간 거래(B2B) 영업을 하는 편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하려면 기업들에 소구할 만한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가상 오피스나 가상의 판매 공간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다. 컴투버스는 하나금융과 교보문고, 교원, 영실업, 닥터나우 등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들의 메타버스 가상오피스를 오는 3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아바타가 있지만 실물 얼굴을 작게 띄워서 현실과 가상세계 간 중첩을 유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칼리버스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 2023’에서 유통 명가의 강점을 살려 지방시 록시땅 메이크업포에버 등 유명 브랜드가 다수 입점한 메타버스 쇼핑몰의 모습을 실감 나게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MS가 소비자 대상 메타버스에 대한 미련을 접고 산업용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수익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만 해서는 ‘쇼’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자체 화폐 활용
셋째는 경제 활동, ‘메타노믹스’에 대한 고민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구매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금이나 카드 결제까지 이어지는 건 드물다. ‘여기에서까지 돈을 써야 하나’라는 심리적인 장벽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포인트나 암호화폐 등은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자를 가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메타버스 콘서트 등으로 주목받아 온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이프랜드’는 지난해부터 이프랜드 포인트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암호화폐의 형태는 아니지만 쌓인 포인트를 메타버스 내 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에게 후원하거나 아바타의 옷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옛날 싸이월드의 도토리에 가까운 느낌이다.
메타버스의 이용자,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작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도 자신만의 화폐가 활용된다. 게임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월드, 크래프톤의 미글루 등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