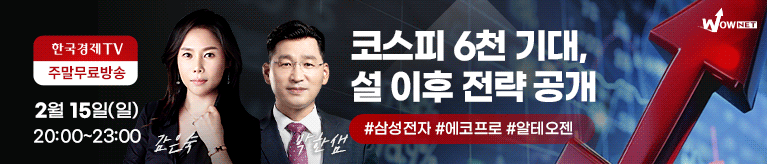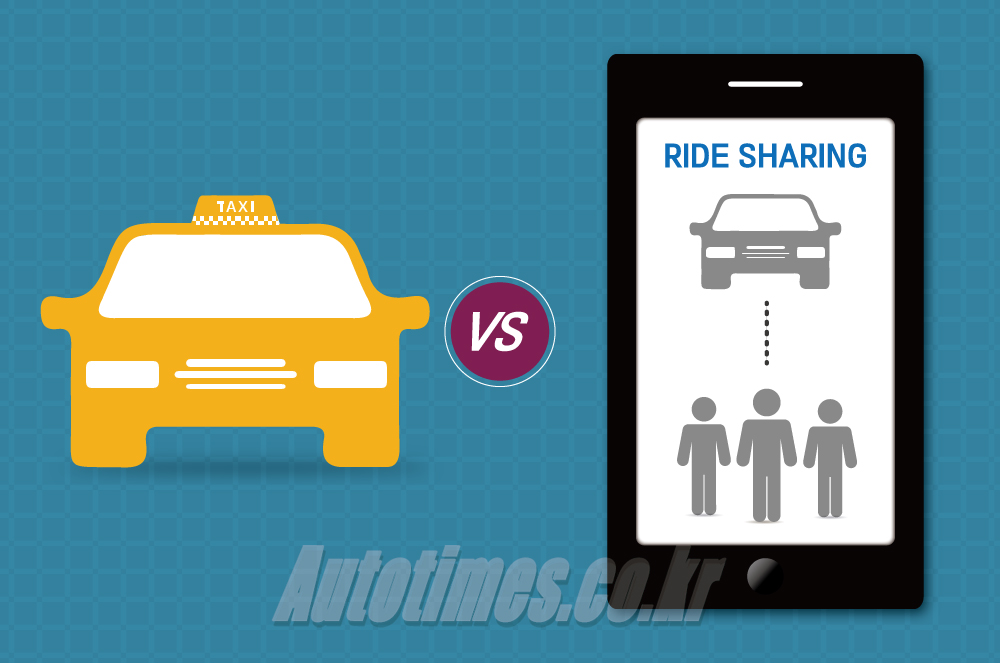
-연결 수수료 부과, 대행인가 사업자인가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미국 뉴욕대 뉴스쿨의 트레버 숄츠 교수는 우버와 같은 카풀 기업이 사용하는 '공유(sharing)'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카풀 기업이 원하는 것은 공유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요에 응답하는 '온 디맨드(on-demand)' 서비스라는 것이다. 반면 카풀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자가용 승차석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빨대경제 vs 공유경제' 논란의 핵심이다.
여기서 양측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정된 수요 때문이다. 기존 운송사업자(택시, 버스, 지하철 등)와 자가용을 활용하려는 카풀 기업이 밥그릇을 놓고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카풀 참여로 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지만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수요 자체가 자가용으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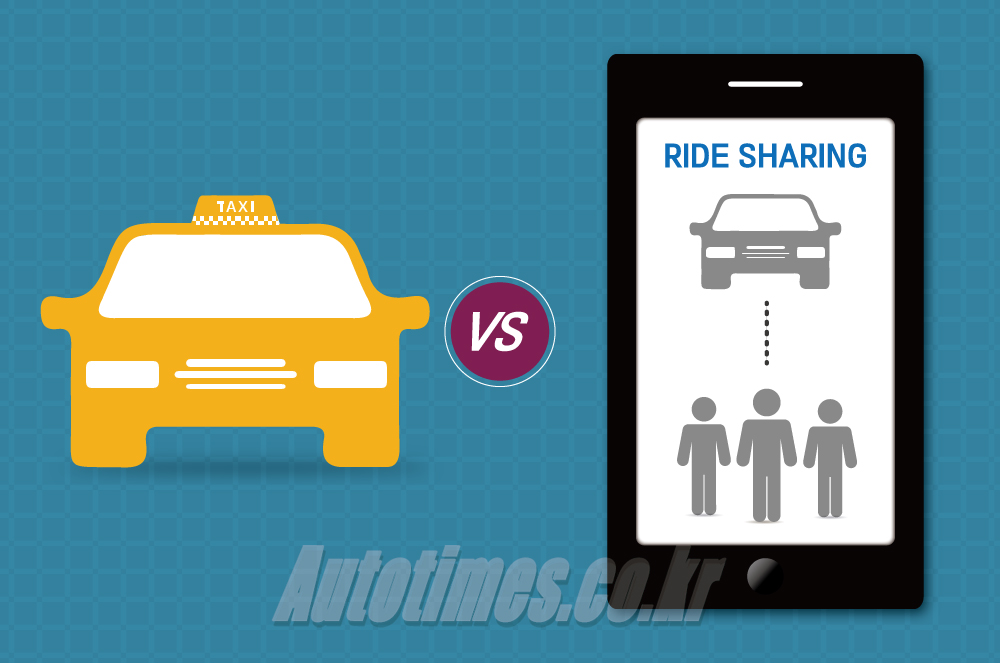 |
현재 국내 교통 운송 체계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이동 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다.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시간에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래도 정체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어 주요 이동 수단이 됐다. 하지만 지하철 등은 철로 연결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연결되는 확장 속도가 늦다. 반면 버스는 어디든 투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전용 차선 등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이 둘은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의 복잡함보다 홀로 편하게 앉아 이동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때는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되며 전자는 자가용, 후자는 택시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으로 둘의 차이는 운전 및 비용 부담의 주체에 있다. '운전'이라는 행위를 근로의 개념으로 본다면 자가용은 '스스로 근로'이고 택시는 '누군가 근로'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육상 이동 시장을 공급 개념에서 보면 대중교통인 철도와 버스, 그리고 개인교통 수단인 택시와 자가용으로 나눠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수송 부문에서 열차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차지한 분담율은 41.3%에 달한다. 2003년 36.8%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비용과 편의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그 뒤에는 국민 전체 세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금 투입에 따른 불만도 높지 않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늘어난 것과 달리 택시 분담율은 2003년 4.8%에서 2015년 3.0%로 떨어졌다. 이용이 편리해진 버스와 지하철 등으로 수요가 옮겨갔고, 자가용 보급률이 높아진 탓이다. 하지만 자가용도 보급이 늘었을 뿐 이동은 줄었다. 자가용 수송 분담율은 2003년 58.3%에서 2015년은 55.8%로 2.5% 감소했다. 이동 수요가 택시와 자가용으로 표현되는 개인교통보다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 쪽으로 옮겨간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을 택시로 활용하자는 카풀이 등장하자 가뜩이나 수요가 줄어드는 택시로선 반가울리 없다. 그러자 카풀은 '나 홀로 운전'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공유'일 뿐 택시 수요를 잠식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자가용의 빈 공간이 채워질수록 택시 점유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버가 진출한 모든 나라가 겪은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가용 이동 공간이 채워질수록 버스와 철도 등의 대중교통 또한 승객을 카풀로 내주게 된다.
그런데 대중교통 승객 감소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세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서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은 없애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자가용 이동은 늘어나는 형태이니 도로의 복잡성이 늘어 운행 평균 속도는 떨어진다. 그에 따른 배출가스 및 에너지 소비 증가는 국민 전체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한편에선 수익 논란도 한참이다. 카풀의 경우 본업이 아닌 출퇴근 부업이어서 말 그대로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유료 운송 행위는 곧 영업인 만큼 자동차보험료는 영업용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출퇴근 카풀이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카풀이 전면 허용되면 영업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오히려 보험료 추가 부담이 부수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수익을 얻는 곳은 카풀앱을 운영하는 IT 기업이다. 자가용 카풀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동 수요를 자가용으로 옮겨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여서 '빨대경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트레버 슐츠 교수는 카풀 등이 '공유경제'로 불리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지금의 카풀은 공유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사업에 불과해서다. 당장은 카풀이 국민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편익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국민적 불편함만 초래할 뿐이고, 한국이 아직 가지 않은 것은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차라리 가지 말라고 조언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택시와 카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육상 수송분담율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택시와 자가용의 공존은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다. 서로 '윈-윈'이 쉽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경쟁이다. 그리고 경쟁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택시와 카풀 모두 새로운 규제를 받든지, 아니면 규제에서 벗어나든지 둘 중 하나다. 택시는 규제하고, 카풀은 규제하지 않는 한 양 측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권용주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 [하이빔]디젤 퇴출은 가능할까
▶ [하이빔]BMW 화재 원인, 해석만 제각각
▶ [하이빔]디젤 대체할 LNG 트럭 보급, 속도 붙을까?